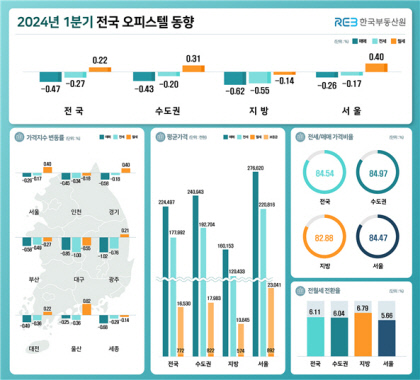![[강문숙의 즐거운 글쓰기] 글의 제목 붙이기](https://www.yeongnam.com/mnt/file/201904/20190422.010180756210001i1.jpg) |
글을 써놓고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본 것이 제목 붙이기일 것입니다. 사실 제목을 처음부터 붙이든 나중에 정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창작자에 따라 심지어 제목을 정해놓고 쓰다가도 정작 마무리할 때 보면 전혀 엉뚱한 제목으로 완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심하는 그 자체도 글쓰기의 중요한 과정임은 물론이지만, 대충 붙였다가 글의 진정성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로 제목을 적당하게 잘 붙였을 때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글에 대한 신뢰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목을 고치거나 바꾸는 사이에 특히 시는, 진화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이 시의 내용과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지요.
‘북악은 창끝처럼 높이 솟았고/ 남산의 소나무는 검게 변했네/ 송골매 지나가자 숲이 겁먹고/ 학 울음에 저 하늘은 새파래지네’(박지원의 ‘極寒’)
이 시에서도 시인은 제목을 몹시 추운 날씨라고 분위기를 잡아놓았지만 정작 시 속에서 추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예상하던 독자의 기대를 외면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미의 단절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날씨를 드러내고 있지요. 추위에 관한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제목에서만 ‘극한’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내용에서 ‘창끝’ ‘검게 변한 소나무’, 학의 울음에도 ‘새파래지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의미의 단절을 채워 제목과 본문을 잇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편의 시작품은 여러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전체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때 제목은 전체 구조를 한곳으로 응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조의 확장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제목을 붙일 때는 첫째, 본문의 주제나 내용과 일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둘째, 너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제목은 피할 것. 셋째, 본문의 내용을 모두 풀어 제시하는 제목은 피할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시의 경우 내용이 추상적일 때는 구체적인 제목으로, 내용이 구체적일 때 제목은 추상적으로 붙여보는 것도 서로 조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지요. 요컨대 제목을 붙일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호기심을 유발하되 난해하지 않게 하며, 은근히 암시하되 언뜻 비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론 뜻을 안으로 감추는 제목을 붙였을 때, 내용은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하나를 세워야 한다// 날카로운 그믐달 하나를 새벽하늘에 걸어야 한다// 저 서릿발 고스란히 견디는 검은 나무// 일억 년쯤 그 자리 지키는 바위의 침묵// 내 목숨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아득한 저편이 분명 있어야 한다’(정병호 시 ‘결심’)
내용과 제목이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시를 읽다가 보니, 그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의자를 바짝 당겨 앉기도 합니다. <시인·전 대구시영재교육원 문학예술 강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스케치] 세월호 참사 10주기···대구 동성로에도 시민분향소 마련](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6001550419_1.jpg)
![[뉴스와이]4월16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500190415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