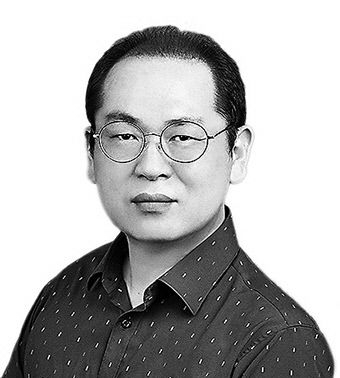
최수경 사회에디터
대입 삼수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고지는 빤히 보이는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심적 고통.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민선 8기 끝자락에서 대구와 경북이 힘든 결정을 했다. 다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3~4년 차(2019년 12월~2021년 4월)에 처음 시도했다. 전국 최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2024년 5~12월)에도 도전은 있었다. 이번이 TK통합 시즌3다. 실패엔 깨달음도 있는 법. 통합특별법 초안 작업까지 갔던 시즌1에선 코로나로 낭패를 봤다. 이는 시·도민 관심 유도 실패,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그 때 취재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켜봤던 입장에선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뼈아팠다. 공론화 테이블에 처음 올랐던 경북 북부권 발전계획은 빛을 보지 못했다. 시즌2에선 통합청사 위치, 관할 구역에 대해 논쟁만 하다가 비상계엄 탓에 불씨가 꺼졌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큰 텐트를 들고 나왔다. 통합 시 20조원(총 4년)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잃는 것에만 익숙했던 TK에겐 솔깃한 당근책이다. 더욱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올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겠다고 선수를 쳤다. 자칫 TK는 실익은 못 챙기고 멍석만 깔아주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잠자던 생존본능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다.
냉철한 진단과 희망코드도 있다. 2주 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신년교류회' 때다. 당시 논의된 내용 중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지점이 여럿 있었다. 크게 신경을 못 썼던 사안이다. 산업화(1960년~1980년) 시대엔 TK 등 영남권과 수도권이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IT붐이 불면서 시작된 정보화시대부터 영남권은 확실히 쇠락해갔다. 기업 투자가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청년과 돈, 각종 정보도 깡그리 빨아들였다. 망국병인 이른바 '서울 몰빵주의'가 또아리를 튼 것. 지금은 경기·인천까지 팽창해 수도권 인구비중은 52%나 된다. 정치적 실익을 의식해 알면서도 방관한 역대 정부와 정치인 탓이 크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겼다는 점이다. 물론 기회요인은 있다. AI 데이터센터, AX 전환이 경쟁력인 시대엔 비수도권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시대에 수요가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선 감당이 안되니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중요한 건 말로 기업을 설득해선 소용없다는 점이다. 기업 스스로 오도록 '여건'을 갖춰야 한다. 고급 석·박사 양성,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통큰 규제완화 패키지 등…. 그 조건의 정점에 행정통합이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TK통합 시즌3에 대해 일각에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린다며 불만을 표한다. 대구 공무원들은 행여 경북 외진 곳에서 근무하게 될까봐 안절부절이다. 경북과 합치면 대구가 서울처럼 '블랙홀'이 된다며 경계하는 이들도 적잖다. 더 중요한 건 빼앗긴 TK 미래를 되찾아와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합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핵심시설을 기능별로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 고통·희생이 없이는 다시 성장가도에 오를 수 없다. 미국 최초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고 법을 따라오게 하라"고 했다. 같이 위대한 기록을 써내려 갈 용기 있는 시도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영·호남 공동선언…균형발전 위해 한목소리](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1/news-a.v1.20260117.4488c7d29e8f4de5a88e577b3de90ceb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