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만나는 박주영 두번째 시집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일상 풍경 속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인간애 담아
 |
| 박주영 시인의 시선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풍경에 머물지만, 그 적막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자아를 찾아낸다. 〈게티이미지뱅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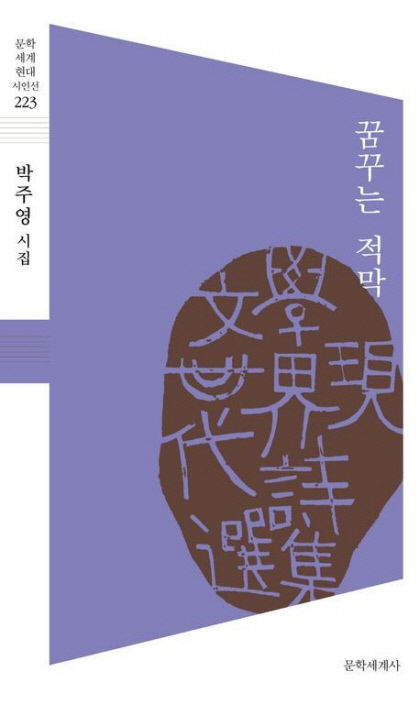 |
| 박주영 지음/문학세계사/136쪽/1만2천원 |
박주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2003년 첫 시집 '문득, 그가 없다'를 펴낸 지 21년 만이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의 시선이 머문 풍경은 한없이 쓸쓸하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화랑공원 팔각정 아래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은 적막하기 그지없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연속극 보며, 혼자 웃고 웃는, 빈집'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롭다. '등 떠밀려 후두둑 쏟아지는 가을 나뭇잎'에는 상실감마저 깃들어 있다. 하지만 시인은 깊은 적막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되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자아를 찾아낸다.
"(전략)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 기어간다// 새들은 절벽 위에서/ 날아가는 법을 배운다지만/ 조것들은 어디서 인내심을 배운 걸까/ 티끌 같은 발로 눈물처럼 기어간다// 햇살이 조팝나무 잎사귀에/ 가만가만 손 얹고 있는 한낮,/ 적요의 저 온몸이 필기체다/ 벌레 한 마리 회벽 아래 기어가며/ 그만의 시를 쓰고 있다"('적요의 저 온몸이 필기체다' 중)
시집을 관통하는 또 다른 시어는 '사람'이다. 시인은 늦은 저녁 식사 뒤, 발겨 먹어 뼈만 남은 고등어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다. 아버지의 빈번한 일탈에도 일곱 남매를 꿋꿋하게 키워낸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절절하게 그려낸다.
"(전략)어머니는 뼈만 남은 고등어처럼 야위어도/ 우리 남매는 쑥쑥 자라면서/ 저마다의 시간으로 자맥질하느라/ 깁스한 어머니의 마음은 읽지 못했다// 종달새는 새끼를 지키려고/하루에 삼천 번씩 우짖는다는데/ 어머니의 한 많은 평생이/ 얼마나 가팔랐을까/ 이젠 하늘에서 빈집을 내려볼 어머니// 아, 입만 있는 것들/ 입밖에 없는 것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 날에/ 만져지던 그것이 사리였구나"('사리' 중)
세상을 먼저 등진 남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은 첫 시집에 이어 이번에도 여전하다.
"아주버님은 저 세상 남편을 많이 닮았다// 오늘 아주버님 생신이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 누가 엉덩이를 톡, 톡 친다// 정적, 말은 없어도 느낌은 있다// 내 다 안다, 그 사람이다"('저녁' 전문)
2021년 별세한 문인수 시인과 생전 대화 몇 토막도 곁들여 '흰 구름'처럼 무심히 떠난 그를 떠올린다.
"나는 딱, 아흔아홉 살까지만 살끼다/ 에고 샘요 쪼매만 더 보태 보시지예/ 뭐 할라꼬, 고거 마 됐다// 허허허허……/ 호하하……// 흰 구름이 웃음소리 따라 흘러간다/ 그 웃음소리 따라 아흔아홉 살까지 살 거라던/그를 무심한 흰 구름이 떠메고 흘러간다"('엽서-문인수 시인' 전문)
시인의 시선은 동네 공원부터 전국의 산과 바다를 거쳐 해외까지 이어진다. 그러다 마침내 떠돌다 돌아와 깃든 곳은 '집'이다.
"(전략)그 작은 새에게 홀리고/ 그곳의 한적한 풍경에 다시 이끌려/ 석 달 열흘쯤 붙어살까 하고/ 꾸려 간 짐을 풀었습니다// 겨우 초저녁인데 짙게 깔리는/ 산 그늘이 흡사 나를 끌고 가는/ 저승길의 광목천 같았습니다(중략)// 명쾌하지 않은 길이 내 생의/ 끝자락을 흔들어대는 것 같아/ 쫓겨나듯이 열흘 만에/ 두고 갔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한 새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 맑고 고운 새소리는/경건하고 눈부신 문장 같습니다"('귀가' 중)
대구 출신인 박주영 시인은 1993년 '문예한국' 신인상과 1995년 '심상'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했다. 시집 '문득, 그가 없다'와 다수의 공저를 냈다. 한국시인협회, 대구시인협회, 심상시인회 회원과 대구문인협회 이사로 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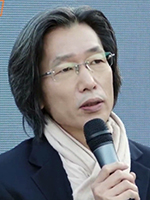
백승운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영·호남 공동선언…균형발전 위해 한목소리](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1/news-a.v1.20260117.4488c7d29e8f4de5a88e577b3de90ceb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