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교육' 문제점 진단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설명
獨사례 들며 개선 필요성 역설
 |
| 신간 '우리 동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정치교육이 발전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혐오와 불신의 시대다. 살기 팍팍하다. 각자도생이 시대의 정언명령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문학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다. 소수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가 넘친다. 우리는 불안에 허덕이게 됐다. 그 대상이 내가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최근 계엄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단테는 주장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이 아니다. 시민 누구나 자기의 삶을, 사회를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이 이를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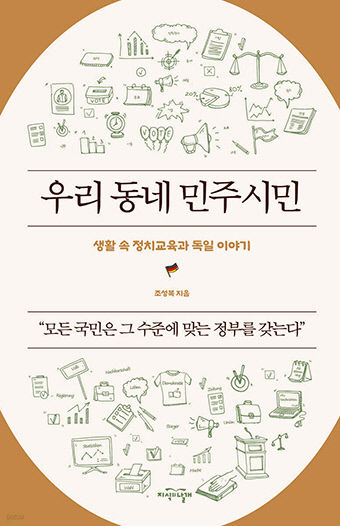 |
| 조성복 지음 /지식의날개/1만8천800원 |
신간 '우리 동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정치교육이 발전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며, 정부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의 정치의식 수준을 키워야 함을 시사한다. 독일에선 다양한 주제로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할 수 있다고 여겨 정치교육을 제도화하는 데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저자는 이런 점에 주목해 독일의 학교·도시·공동체·정당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살핀다. 정치교육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정치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편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정당·시민단체도 강연을 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 내용이 현실정치에 대한 안목이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치를 위한 정치 이론에 갇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정치적 행위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의 학생대표 투표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 과정,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개선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책의 1부에선 우리나라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말한다. 다수의 시민이 정치나 정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정치교육에서 다루면 좋은 내용을 제시한다. 2·3부에선 각각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현황과 전망을 독일의 사례와 대조해 분석한다. 독일 연방학생회의 16세 선거권 요구, 청소년의 정치 참여,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독일 시민대학의 정치교육 등을 다룬다.
저자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한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던 1990년대 대기업 과장 진급을 목전에 두고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독일 통일을 지켜보며 정치와 경제의 상관 관계, 이들의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쾰른대와 두이스부르크-에센대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정치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받았다. 졸업 후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2/news-a.v1.20251215.b36d2a2c5e8646909f1c2359405f52ae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