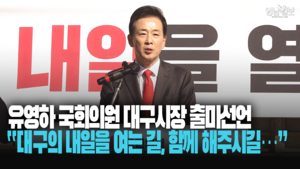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김미진<영남대 겸임 교수> |
과거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은 일방향(一方向)이었다.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관객은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형식은 사실 소통이라기보다는 창작자가 지니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조이다. 결코 예술가와 관객의 올바른 관계 정립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현재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작품 관람 후기를 쓰고, 평점을 매기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정도다. 소비자가 창작자의 결과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 나아가 관객의 니즈(needs)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방향적 소통으로 작품을 생산해 낸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예술가는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관객이 어떤 부분에서 울고, 웃고, 공감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른 그들의 표정이 예술창작에 있어 큰 의미가 된 것이다. 예술가의 특권인 예술창작에 관객의 의견을 수용해 덧댄다는 것은 달라진 둘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관객의 니즈에 맞춘다는 것이 예술가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관객이 없는, 소비자가 없는 예술 생산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창작자인 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인 관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술 작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느껴진다. 사실 소비자인 관객으로서도 자신의 니즈를 반영한 예술 작품이 제공됨에 따라 효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술창작의 완성은 관객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인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예술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얼핏 들으면 지나친 비약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이 살아남기 위해 관객은 중요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예술의 승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객이 원하는 예술을 할 것인가? 양자택일이 아닌 상생의 전략은 없는지 고민은 깊어진다.김미진<영남대 겸임 교수>

김미진 영남대 겸임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