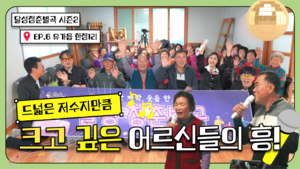정주인구 개념 깬 생활인구
청년들 떠나도 관계는 남아
관계 맺기로 지역에 활력을
소멸 위기 새로운 시각 필요
함께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
|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
지역소멸대응 키워드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실현과제 중 하나로 더욱 부각되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소멸위험지역에서 집중하던 주민등록지 기준의 정주인구개념을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인구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한 주민등록지 기준을 넘어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생활 인구 분류를 살펴보면 총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다. 관광 및 스포츠 분야 활성화분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촌캉스 여행 지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과 맞닿아 있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컨드 홈 활성화, 미니 관광단지 조성,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지역 정주 체험에서 정주 단계로 나아가는 방문 및 교류프로그램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인구개념은 일시적 방문으로 소비 중심의 경제 활성화 효과로 생산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한계점도 있다. 생활인구만으로는 지역소멸대응을 온전히 막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어가는 지역에서 지역과 연고, 접점 등 관계가 전혀 없는 무관계 인구가 아닌 관계인구에서 나아간 생활인구가 간절히 필요하기에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보완정책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소멸위기지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소멸위기 최위험 지역에서 청년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시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관계 인구 맺기 프로그램은 지역을 채워가는 청년의 숫자와 그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지역 활력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이 평가받아오고 있다.
청년들의 정주만을 목표로 하니 청년 이탈 현상이 정책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관광인으로 혹은 단기 방문으로 정기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된 경우도 많았다. 나아가 생활인구로 관계를 맺은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업과 삶을 정의하고 생애주기를 거쳐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나 박사(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장)는 인구 소멸 최위험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해 오며 활동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박사는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확산해 오고 있다. 특히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취·창업 전략을 생활인구의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역은 생활인구 정책으로 지역의 접점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정주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지역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줄탁동시(啄同時)로 지역소멸이라는 알을 깨고 북적이는 생활인구로 활성화된 지방을 기대한다.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박주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