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창록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논제로섬(non-zero-sum) 게임으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각 지역이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공존 가능한 협력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이 제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원적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 그것은 '나음'도 '다름'도 아닌, '다움'이다. '나음'은 비교를 통한 우월성의 추구이고, '다름'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다. 이 모두가 외부의 시선을 전제한다. 반면 '다움'은 자기 안에서 출발하는 정체성이다. 그 지역, 그 공동체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삶의 양식, 문화와 풍경,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짜 매력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이 '다움'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움'의 관점에서 보면,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은 크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원샷·원킬'식의 접근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다움'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고 느린 실험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복 가능한 시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서핑의 도시 양양은 서퍼비치라는 작은 스타트업의 시도를 통해 만들어졌고, 강릉도 여러 커피 전문점과 로스팅 카페, 커피 축제 등 소규모 창업자와 장인들이 모여 '커피도시'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다. 이 모든 작은 시도들이 바로 '다움'의 씨앗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실험은 담대한 연결이다. 나-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연결에 움츠러들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 다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폐쇄적인 행정 단위 내 협력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유연한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소백산을 중심으로 단양과 영주, 서원을 중심으로 영주와 안동, 힐링·생태라는 주제로 봉화와 영주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자연, 문화, 주제 기반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때, 한 도시 안에서 '1000개의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연결은 단지 행정 협력을 넘어서, 지역 밖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문제는 더 이상 '그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전환된다. 광주의 오래된 단관 극장을 살리기 위한 "광주극장 100년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캠페인에 전국적인 관심이 몰린 것도 그러한 예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해법은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구상보다, 다움에 기반한 작은 실험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상력에 주목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시대, 이제는 "얼마나 크냐"보다 "어떻게 다우냐"가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전창록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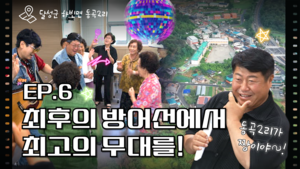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8/news-a.v1.20250814.7bacb67086fe492eb7a7b61185f8db1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