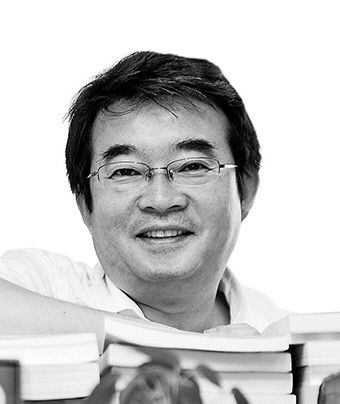 |
| 안도현 시인 |
이분은 과거 철도청 로고를 그리고 '일초여금(一秒如金)'이라 쓴 작은 표지석을 세워두기도 했다. 이 빗돌은 지금 역 구내에 심은 나무에 가려 꼭꼭 숨어 있었다. 김찬빈씨는 역무원이었지만 산골 약초꾼들이 캔 산작약을 비롯한 한약재를 모아 도시로 보내면서 적지 않은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 1956년 영주에서 철암까지 영암선이 개통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영암선 개통기념비'라는 글씨를 친필로 써서 비에 새겼다. 기념비는 승부역과 붙은 민가 안쪽에 세워져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승부역 간이음식점 의자에 앉아보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정.
강을 따라 양원역을 향해 걷는 길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다. 옛사람들이 비경이라는 케케묵은 수식어를 왜 그리 자주 사용했는지 알 만하다. 강줄기를 따라 형성된 절벽과 강변의 너럭바위, 강물 속의 집채만 한 바위들, 하늘을 찌르는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산봉우리들…. 오분 걸으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십분 걸으면 또 주저앉아 오래 바라보고 싶은 골짜기가 펼쳐진다. 물빛은 더없이 맑았지만 납과 아연을 추출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에서 악성 발암물질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각금마을은 올해 3월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마을이다. 영동선 철도 구간의 예비전력 3㎾를 마을로 당겨쓸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서 허락을 한 것.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김승태씨의 안내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마을로 올라갔다. 말이 마을이지 현재는 모두 세 가구뿐이다. 한때 70여 명의 화전민이 살았다는 마을에는 허물어진 돌담이 집터였음을 알려준다. 각금은 '까끄미'의 음차. 깎아지른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일까. 아름드리 돌배나무가 우리 일행을 맞이하듯 흰 꽃을 무더기로 피워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집에 사는 부부는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온 건 처음이라 했다. 우리는 배낭 속의 귤과 음료수를 꺼내 건넸고, 주인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두릅 순을 한 쟁반 데쳐 내놓았다. 다음에 또 들르게 되면 삼겹살이라도 두어 근 끊어가 드려야지.
세평하늘길은 협곡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봄꽃이 지천이었다. 앙증맞도록 꽃잎의 모양이 또렷하고 예쁜 매화말발도리를 눈이 시리도록 많이 보았다.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절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돌단풍 또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쇠물푸레나무는 가지 위에 구름을 풀어 띄워 놓은 듯 개화가 한창이었다. 원추리 군락이 수십 미터 이어지기도 했고, 손에 잡히는 당귀 순을 뜯어 씹으면 봄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양원역은 그 스토리가 봄볕 같은 곳. 주민들의 요청으로 1988년 열차가 정차하게 되자 주민들은 손을 모아 역사를 지었고 영화 '기적'의 소재가 되었다. 한 시간 반이면 걷는다는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세 시간을 쉬엄쉬엄 걸었다. 걷고 나서 우리는 백두대간 협곡열차에 올랐다. 철마다 한 번씩 와서 걸어보고 싶은, 숨겨 놓기 싫은 곳.
안도현 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T1.jpg)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2/news-a.v1.20260227.d06eea0aaf934bcc9e87399f285ed370_T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