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가지도자의 역할
비뚤어진 관점을 바로잡고
더 정확한 정보 전해졌다면
국민이 어이없는 고통 겪는
지금의 비극 피해갔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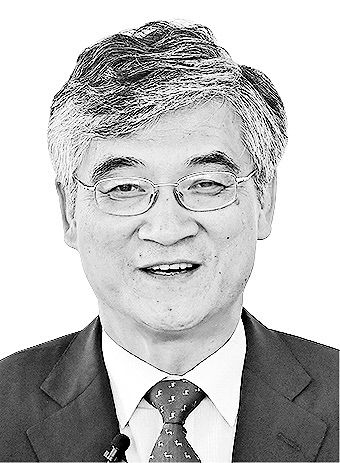 |
|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
오늘이 바로 '기자의 날'입니다. 2006년 5월20일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으니 오늘은 20회째 맞는 '기자의 날'인 것입니다. 먼저 힘든 환경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전국의 3만2천여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12·3 내란과 민주주의 위기에 분노하는 한 시민으로서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자의 날'의 의미가 오늘날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서입니다.
# 5월20일, '기자의 날'
먼저 5월20일을 '기자의 날'로 정하게 된 사연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198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일, 신군부는 수도권에 한정됐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무참하게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인 18일부터 민주화 함성이 특히 광주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확대와 헌정파괴에 항거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도 합세했습니다. 계엄군은 무차별 폭행과 체포로 대응했습니다. 21일에는 전남도청 앞의 학생과 시민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시민 학살이었습니다. 27일에는 도청의 시민군이 처절하게 진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5월20일부터는 계엄사령부가 주요 언론사에 직접 검열관을 파견했고 모든 기사와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열했습니다. 정부와 군의 공식 발표 외에는 보도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일부터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보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주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봉쇄했습니다.
언론이 신군부의 스피커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광주시민을 폭도로, 그들의 저항을 '북한 간첩의 사주'로 인한 '소요사태' '불순세력의 폭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후보가 '광주사태'라고 한 것도 당시 신군부의 인식이고 무릎꿇은 언론이 받아쓴 용어였습니다.
# 진실의 힘
그러나 진실과 정의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맹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불의는 패한다. 그것이 천하의 이치다. 天下之理, 義勝而不義敗也.'
신군부의 언론통제가 노골화되던 5월20일이었습니다.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군부독재와 언론검열에 반대해 제작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처절한 선언과 함께 집단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23일에는 MBC의 한 보도국 간부가 양심의 외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편집회의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라 말할 수 없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6월9일 그는 남영동 분실로 연행됐고 곧이어 해직됐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러 2006년이 됐습니다. 후배 기자들은 1980년 5월, 군홧발 앞에서 무너진 언론이 어떻게 국가 비극을 초래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곡필 거부와 진실 보도에 목숨 건 선배 기자들의 용기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기자의 본분과 직필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5월20일을 '기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야말로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자가 기자일 수 있고 기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아픈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요즘 기자정신이 흐릿해졌다는 국민의 원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12·3 내란 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와 국가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윤석열의 비뚤어진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국민이 이렇게 어이없는 고통에 신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한 사실과 정보가 전해질 수 있었다면 지금의 이 비극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기자의 날'이 너무 아픈 이유기도 합니다.
최종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지만 기자 자신도 기자정신을 지켜내지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 5월2일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41∼43위였던 것에서 크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지난 3월,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 기자정신이 다시 살아야
거창한 국제조사 결과가 아니라도 우리는 언론자유가 무너지는 과정을 뼈아프게 목도해 왔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여사'를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감'이라 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식칼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직후의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공론장, 민생까지 무너진 현실에 기자 자신이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정론과 진실 보도로, 12·3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다짐이 필요한 오늘인 것입니다. '기자정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오늘, 20회 '기자의 날'을 맞아 이 땅의 3만2천여 기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당면 숙제입니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2/news-a.v1.20251215.b36d2a2c5e8646909f1c2359405f52ae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