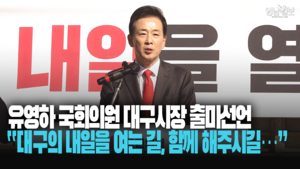조선 인종이 세자 시절 자신의 스승인 김인후에 직접 그려 하사한 묵죽도. 왼쪽 아래에 김인후가 이 묵죽도에 대해 쓴 시가 있다. <장성 필암서원 소장>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시인으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룰 만큼 학문적 깊이가 깊었다. 그는 특히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을 지향했던 인물이다. 선비들은 덕행과 풍류의 깊이를 더하는데 거문고를 반려로 삼았고, 다른 많은 선비들처럼 김인후도 거문고를 즐겼던 것 같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거문고는 단순히 악기를 넘어선 정신 수양의 도구였다. 시·서·화와 더불어 거문고를 아는 것은 선비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소양이었다. 거문고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고결한 인품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인후는 전남 담양의 대표적인 원림인 소쇄원을 자주 방문하여 소쇄원 주인 양산보(1503~1557)와 깊은 교유를 나눴다. 그는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소쇄원사십팔영'을 지었다. 이 시는 소쇄원 내의 마흔여덟 가지 경물을 하나하나 노래한 48수의 오언절구 연작시다. 소쇄원의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김인후의 감정,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선비의 정신이 담겨 있다.
당시 소쇄원의 모습과 각 공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시다. 그리고 소쇄원이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을 넘어 학문과 수양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중에는 거문고를 언급하며 지음(知音)을 그리워하는 구절도 포함되어 있는데, 김인후의 거문고에 대한 인식과 풍류적 면모를 보여준다.
제20영(詠) '옥추횡금(玉湫橫琴)', 즉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를 비껴 안고'라는 제목의 시다. '거문고 타기가 쉽지 않은 건/ 세상에 종자기(種子期) 같은 사람 없어서라네/ 맑고 깊은 물에 한 곡조 울리면/ 마음과 귀는 서로 안다네'.
이와 같은 시를 보면 김인후도 거문고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거문고를 벗 삼아 풍류를 즐겼고, 거문고를 벗 삼아 인격을 도야했다. 인격 도야의 수단이기도 했던 거문고를 다루는 이에게는 그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중요했다. 거문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담긴 뜻을 가장 잘 알아준 사람으로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다는 종자기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 당시에 거문고를 잘 타는 명인으로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아의 친구 종자기는 소리를 잘 듣는 데에 탁월했다.
백아가 높은 산의 형상을 그리며 거문고를 타고 있으면 종자기가 "아, 멋지도다. 마치 태산준령 같구나" 하며 감탄했는가 하면, 흘러가는 강물을 묘사하는 곡을 들으면 "아, 기가 막히도다. 흐르는 물이 마치 황하나 양자강 같구나" 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백아도 감탄해서 "아, 멋지도다. 그대의 듣는 귀나 생각의 깊이는 마치 내 속마음 같도다. 그대 앞에서는 거문고의 소리를 속일 수가 없구나"라며 끔찍이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기를 그토록 알아주던 종자기가 병이 나서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깨뜨리고 줄을 끊어 버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거문고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백아절현(伯牙絶絃)'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다. 또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지음(知音)'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인후의 이 시에서도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처럼, 거문고 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갈망하는 김인후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가 거문고를 통해 단순한 소리 그 이상, 즉 마음의 소리를 서로 나누는 진정한 교감을 추구했던 것이다.
소쇄원의 계곡 물소리, 바람 소리와 함께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지는 환경은 그에게 최고의 수양 공간이자 풍류의 장이었을 것이다. 거문고 연주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김인후는 조선의 다른 많은 선비들처럼 거문고를 단순한 악기가 아닌, 정신 수양과 진정한 교감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겼던 것이다. 특히 '소쇄원사십팔영'에 남겨진 그의 시를 통해 거문고에 대한 생각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지음에 대한 갈망을 알 수 있다 하겠다.
◆김인후와 소쇄원
소쇄원은 양산보가 지은 별서정원이다.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화를 입자 충격을 받고 낙향하여 조성한 곳이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정신을 수양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152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1530년대에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소쇄원은 계곡의 물줄기를 그대로 활용하여 물의 흐름에 따라 여러 공간을 배치했다. 광풍각, 제월당, 애양단 등 다양한 정자와 누각이 자연 속에 어우러져 사계절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낸다. 특히 계곡물이 다섯 굽이 흘러내려 '오곡문'을 이루는 풍경은 소쇄원의 백미로 꼽힌다.
김인후는 양산보의 친구이자 사돈 관계였다. 김인후는 담양 인근 장성에서 태어나 인종의 스승을 지냈으나, 을사사화 이후 낙향하여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그는 소쇄원을 자주 드나들며 양산보와 깊은 교유를 나누었고, 소쇄원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탄했다. 김인후와 소쇄원은 조선시대 사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인후는 '석천 임억령의 집에서 주고받음(林石川億齡第酬唱)'이라는 시에서도 거문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깊고 얕은 술잔을 주고받고, 길고 짧은 노래를 함께 부르네/ 여기에 참다운 뜻이 있으니, 누가 이 큰 소리를 알겠는가/ 얼굴 들어 한바탕 웃으며, 솔바람 거문고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네'.
임억령은 그가 가까이 지냈던 선배다. 이들은 나중에 성군이 되리라 기대했던 인종이 갑자기 죽고 어린 명종이 즉위하여 외척 윤원형 세력이 발호하기 시작하자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했다. 낙향 후 그는 임억령의 집을 찾아 함께 술과 시를 나누며 망년지교를 이어갔다.
첫째 연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다. 둘째 연은 그들의 친교 관계를 말하고 있다. 마치 백아와 종자기처럼 그들도 거문고를 타며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지음의 관계라는 것이다. 셋째 연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고고한 태도를 담고 있다. 솔바람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