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선문화관 설립 앞두고
익숙지 않은 이름에 명칭 고민
전선문화는 대구 유일의 자산
명칭 바꾸지 말고 널리 알리면
대구의 독특한 장르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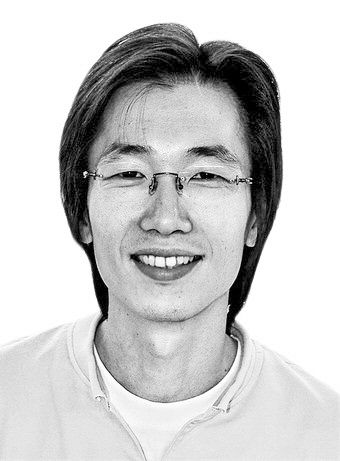 |
| 백승운 문화부장 |
전선문화(戰線文化). 익숙지 않은 단어다. 풀이하면 '전쟁 속에서 피어난 문화'쯤 된다. 대구시가 전선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관을 조성한다. 가칭 '한국전선문화관'이다. 대구 중구 향촌동 옛 '대지바' 건물을 리모델링해 건립할 계획이다. 대지바는 6·25전쟁 당시 피란 문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구상 시인이 후배 문인들과 자주 들렀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전선문화관의 밑그림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맡고 있다. 최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필자도 기회가 돼 참석했다. 대경연구원이 제시한 전선문화관 전시 계획안은 꽤 완성도가 있었다.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국전쟁기 대구의 재발견'이었다. 전쟁 당시 대구는 함락되지 않은 도시였다. 당연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도 아니다. 하지만 대구는 포용과 반전의 계기를 만든 상징적인 도시다.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을 보듬고 그들과 보리죽을 나눠 먹은 이들이 대구시민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 그들을 가르친 도시가 대구였다.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학도병을 모으고 그들의 훈련을 담당한 곳도 대구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구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공간화하는 것이 대경연구원의 복안이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 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예술'이다. 이는 대구가 전선문화관을 조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는 6·25전쟁 당시 한국문단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전쟁 초기 문총구국대가 피란 보따리를 푼 곳이 대구였다. 1·4후퇴 이후에는 전국의 문인 절반 이상이 몰려들었다. 80%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은 공군종군문인단과 육군종군작가단을 결성해 격동의 시대를 기록했다. 전선문학과 전선시첩이라는 잡지를 제작해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노래했다. 시인 구상을 비롯해 조지훈, 최인욱, 박두진, 박목월, 마해송, 최상덕, 이호우, 최태응, 박영준, 장덕조, 정비석 등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중심에 섰다. 문인뿐만 아니었다. 음악가 권태호, 김진균, 윤용하, 화가 이중섭 등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구가 전선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경연구원은 '한국전쟁기 대구의 재발견'과 '전쟁 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예술'을 핵심 키워드로 전선문화관의 전시계획을 밝혔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노력이 엿보여 만족스러웠다.
자문회의에서는 한국전선문화관의 이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선문화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필자는 '전선문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직 익숙지 않은 단어지만 전선문화는 대구만의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선문화관 설립을 통해 이를 꾸준히 알리고 되새김한다면 언젠가는 인지도가 높아지고 익숙한 이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는 명실상부한 전선문화의 성지가 될 수 있다. 한 시대를 증명하고 전선문화의 거대한 발자취를 조명하는 '대구만의 전시관'이 되길 기대한다.
백승운 문화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2/news-a.v1.20251215.b36d2a2c5e8646909f1c2359405f52ae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