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劇場 소설 기법의 인물스토리] 백세 앞둔 화백 전선택
 |
| 화업 80년을 넘어선 99세의 원로화가 전선택. 지난해 대구미술관 초대로 자신의 평생 작품을 선보인 회고전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오는 44회 개인전을 위해 종일 8시간을 캔버스 앞에서 용맹정진의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여느 서양화가처럼 쉬 추상과 초현실주의로 침잠하지 않으려 한다.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의 이미지를 전선택 스타일의 정서로 환치시킨 뒤 그가 밀어올릴 수 있는 최정점으로까지 형태를 평면화시키려 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연대기, 그 중에서도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려 한다. 지금 그림의 화두는 어린이다. |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인생사도 계절이 순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같고….
망백(望百·91세)을 넘어 상수(上壽·100세)를 눈앞에 둔 나는 화가 전선택. 그림이 닦아놓은 화로(畵路)를 줄곧 걸어왔지. 그림의 성과는 세상의 몫이겠지만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점에선 난 그런대로 내 천명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 같아. 그게 나로선 최고의 성과겠지.
그림! 그건 운명, 아니 내 감옥이기도 했고…. 99세의 화가라니. 이 황망하고 난감한 나이에도 난 아직도 화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생리적인 삶은 얼추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내 예술적 삶은 아직도 꼿꼿하게 화폭을 응시하고 있지. 그게 내 영혼의 척추랄 수도 있어. 종일 그러고 살아. 그게 고독하면서도 일견 뿌듯하기도 하지.
예술적 삶은 '영혼의 척추'처럼 여전히 꼿꼿
작년 대구미술관서 그림인생 조명한 회고전
화가로서의 숨 가쁜 삶 객관적으로 본 계기
요즘 화두 '아이'…어른스러움이 아이다운 것
평안북도 정주군의 '허천무'라는 곳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山川과 밀어 나누기를 좋아했다
74년전 떠난 고향 아직도 소상히 그릴 수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의 '환향' 특히 아끼는 내 작품
 |
| 1981년 완성한 '환향'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인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남북통일이란 이산가족의 염원을 그만의 터치로 그려낸 것이다. |
몇년 전까지는 그런대로 생기가 있어 조금 산책도 했는데, 요즘은 다리 근육이 부실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있지. 내 곁에서 한결같이 동행해준 94세의 아내(이인복)는 지금 요양원에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예순의 딸이 고맙게도 날 챙겨주고 있어.
지난해는 내게 무척 뜻깊은 해였어. 대구미술관에서 내 그림인생을 집중 조명해주는 회고전을 마련해 주었어. 퍽 의미가 깊었지. 숨 가쁘게 달려온 화가로서의 내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저 그림 보이지.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 난 저 평화로운 정경이 삶의 요체라 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건 지옥이지. 그들이 다시 고향에서 만나면 지옥은 일순 천국으로 변해.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의 요체도 사람들의 모습이야. 어른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 사이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겠지.
요즘 내 그림의 화두는 아이야. 그것에 꽂혀 있어. 될 것도 없고 되려 할 것도 없고, 뭐랄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인정해야만 하는 지금 내 얼굴을 보면 어린 시절의 내가 어른거려. 가장 어른스럽다는 건 가장 아이스러운 거지. 어른이 잘 숙성되면 그 인격은 결국 아이스럽지. 아이에서 출발한 인생이 어른을 거쳐 다시 아이로 돌아오는 것, 그게 삶의 요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다들 어른 단계에서 성장이 멈추거나 제대로 된 어른도 못 돼보고 일상의 포로로 무릎 꿇는 인생이 대다수라고 봐야겠지.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 많던 살점도 다 사라지고 필요한 것만 말갛게 남아 있는 가장 홀가분한 경지. 잎을 다 비운 겨울나무의 경지랄까. 그래야만 이듬해 봄도 가능하겠지. 잘 갈무리된 상노인(上老人), 그게 동심의 절정이라고 나는 생각해.
1922년 나는 평안북도 정주군 임포면 원단동 속칭 '허천무(虛川舞)'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김소월 시인의 고향인 곽산면이 지척에 있었지. 경의선이 보였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서해가 캔버스처럼 누워 있었어. 그렇게 아련하면서도 혼곤한 풍경이 예술의 원천이 된다는 걸 후에 알게 됐지. 정치 권력이 키워낸 이념이란 잣대를 치워버리면 남과 북은 그냥 한 몸이지. 하지만 욕망이란 권력은 한 몸을 여러 갈래로 난도질을 해대지. 예술은 찢긴 맘을 하나로 묶어주는 봉합사(縫合絲)랄 수도 있지.
나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고향 산천과 밀어를 나누길 좋아했어. 74년 전에 떠난 고향이라도 그 산천의 지세도를 지금도 소상하게 그릴 수 있지. 자연의 정령이 내 손끝과 붓을 이은 뒤 캔버스로 밀물처럼 밀려왔지. 그 산세와 맞물려 돌아간 고향의 정조는 예술가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로 재현되지. '고향이 창작의 산실'이란 말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거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내 작품 '환향(還鄕)'은 내가 특히 아끼는 작품이야. 한국적 한의 정조와 후기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노랑색~갈색의 기운이 나만의 방식으로 펼쳐진 것 같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 얼싸안고 환희의 춤을 추는 광경. 그건 남북 이산가족이 꿈꾸는 평화통일의 일념을 담은 기도 같은 거겠지. 종교·민족·국가의 분열보다 더 치명적인 것, 그게 결국 가족의 분열이 아닐까?
글·사진=이춘호 음식·대중문화 전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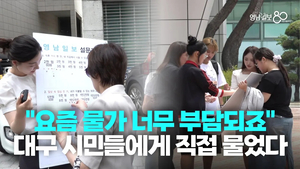
![[직설사설] 안철수에게 물었다. “당대표 출마하실거죠” “이번 대선 패배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6/news-a.v1.20250618.e933e48760034f59b10b2c7285ce98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