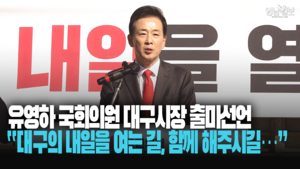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송은석 시민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거리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다. 왕복 10차로 달구벌대로와 왕복 13차로 동대구로가 만나는 범어네거리다. 범어네거리는 역사적으로도 대구 교통·통신의 중심이었다. 범어네거리에 범어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은 교통·통신제도로 '역원'과 '봉수'를 운영했다. 역원은 역과 원을 함께 이르는 말로 행정 중심 교통·통신망이고, 봉수는 군사 통신망이었다. 이중 역은 왕명이나 공문서 전달, 공무로 출장 중인 관원에게 역마와 휴식처 제공, 사신 접대, 공물 운송 등을 담당했던 관공서다.
조선은 역과 관련해 '역도(驛道)' 제도를 시행했다. 역도는 큰 역 아래에 여러 개 작은 역을 묶은 교통체계로, 일종의 교통행정구역이었다. 과거 범어네거리에 있었던 범어역은 청도 성현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현도에 속한 속역으로 성현도에는 모두 17개 속역이 있었다.
범어역은 조선 후기에 와서 규모가 커졌는데 1871년 간행된 '성현역지'에 의하면 범어역은 성현도 속역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컸다. 이는 범어역 인근에 경상감영이 있어 내왕하는 이와 공문서 출납이 많았기 때문이다.
역원제도는 1895년 폐지됐다. 현재 옛 범어역터는 사라져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인 것은 범어역 유물인 '입마시정전방금절목비'가 경북대 야외박물관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비는 1970년 범어네거리 인근 대구여고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한편 역원제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원'은 사신 접대나 공무로 출장 중인 관원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관공서였다. 하지만 역에 비해 제도적 장치나 위상이 낮아 조선 후기로 오면서 사설 주막으로 대체됐다. 조선시대 대구 수성구에는 '시지원(時至院)'이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시지원 위치를 "경산현 서쪽 11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고산초등학교가 자리한 시지동과 거의 일치한다. 물론 시지라는 지명도 시지원에서 유래된 것이다.
최근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수성구 소재 범어역·시지원·법이산 봉수대·성산 봉수대를 문화유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사라진 옛 유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조명될지 기대된다.
송은석 시민기자 3169179@hanmail.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