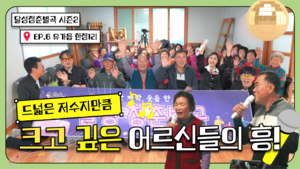■ 프리랜서의 현실세계 들여다보니
국내 787만명…週 평균 46.4시간 노동
전체 취업자 평균보다 1.6시간 긴데다
불확실성·경쟁·과로·번아웃 노출 심각
 |
| 게티이미지뱅크 |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대다. 매일 '회사'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이들에게 '프리랜서'는 꿈만 같은 직업이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다. 노트북을 들고 회사 대신 커피숍으로 출근하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다. 만연한 사내정치도, 답답한 위계질서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프리랜서는 언제든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실은 다르다.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동전과 같이 양면성이 존재한다.
◆확대된 전문가 프리랜서 시장
프리랜서를 위한 플랫폼 '크몽'은 요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IT 개발·마케팅·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등록하면 기업이 가격과 포트폴리오를 보고 프로젝트를 맡길 사람을 선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10만개를 조금 웃돌던 등록 서비스 수가 현재 40만개를 넘어섰다. 전문가 수도 30만명에 달한다. 평생 한 직장에만 일하며 돈을 번다는 개념이 옅어지며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리려는 'N잡' 열풍도 전문가 프리랜서 증가에 한몫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부업 인구수는 약 63만명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본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 근로자 중에서도 부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최근 2년간 16만→19만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들이 부업을 통한 추가 소득 창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비용은 전문 지식 수준, 업무 종류 및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크몽·원티드긱스·위시켓 등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모바일앱 제작 비용은 수십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제시돼 있다.
영국의 일요신문 '옵저버'에서 에디터로 시작한 뒤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솔로 워커'의 저자 리베카 실은 혼자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솔로 워커가 된다는 것은 쉴 새 없이 일하고, 항상 대기하고, 시시때때로 e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혼자 일하는 사람에겐 수십 명의 상사가 생긴다"고 했다. 혼자 일하니 외로운 데다가 과로와 번아웃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여겼다. 프리랜서 같은 1인 근로자의 삶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프리랜서에게 '워라밸'을 묻다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 조직에 속해 일할 때는 갖춰진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조직원들을 관리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야근하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정해진 휴가 기간도 있다. 프리랜서는 자유를 얻지만, 이런 시스템을 빼앗긴다. 재택근무자는 프리랜서보단 낫지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 회사에 출근하면 근태에 따라 '출석 점수'를 받겠지만, 집에서 일하면 오직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결과는 '과로'다. 리베카 실은 "자신 외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솔로 워커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프리랜서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장기간 노출된다. 그런데 생산성 전문가들은 오래 일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두렵고 억압된 느낌을 받는 상태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심리적 터널에 갇히게 된다. '고독'도 문제다. 혼자 일하는 과정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선택은 비즈니스 성과뿐 아니라 심리적·육체적 건강까지 좌우한다. 이렇게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결정권자는 오직 혼자다. 매일 점심 '혼밥'은 일상이다. 함께 상사나 부하 직원 욕을 할 동료와 선후배도 없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자발적으로 과로하고, 맘 편히 쉴 틈조차 없다. 이른바 '불뚝 성질'을 못 이기고 퇴사를 고민하는 이에게 프리랜서는 끌리는 직업이다. 자유는 쟁취할 수 있지만 자유가 성공·행복·편안함과 동의어가 아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프리랜서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세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으로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787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프리랜서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6.4시간으로 전체 취업자 평균보다 1.6시간 길다. 높은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그들에게 긴 노동시간은 더 높은 수입과 더 큰 생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찾기 힘들다.
프리랜서 중 IT 전문가·프로그래머·크리에이터·그래픽 디자이너처럼 비교적 희소성과 전문성이 큰 기술을 보유한 이들은 비교적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청소원·운전기사·단순 노동자들처럼 희소성이 작은 기술을 가진 이들은 기업이 필요할 때만 임시로 고용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 형식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 사업자의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을 '연 수입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한 것.
단순 경비율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쳐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령 연 수입이 2천만원이고 해당 업종 단순 경비율이 80%라면 수입 가운데 1천600만원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로 썼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한 1천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대해선 추가로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 경비율이 79.4%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420만명이다. 연 수입 3천600만원 미만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전체의 86%인 361만명이다. 이 가운데 2천400만~3천600만원 구간에 속하는 38만명이 이번에 새로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