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않던 파리 올림픽의 반전
오랜만의 유도, 살아있는 스포츠
오상욱의 펜싱, 영화의 한 장면
극강의 자세, 아름다운 사격
금메달 중독, 누가 또 정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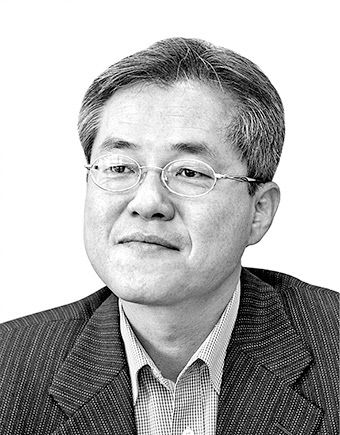 |
| 논설실장 |
파리 올림픽은 애초에 영 흥미가 없어 보였다. 축구 농구 배구, 이른바 인기 구기종목은 출전권조차 건지지 못했다. 선수단 규모도 적다고 언론이 떠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초장부터 기분이 상했다.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국호(Republic of Korea)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소개했다. 사회주의를 사랑한 프랑스라서 그런가.
습기 머금은 열대야는 그래도 TV채널을 올림픽에 고정시킨다. 오랜만에 보는 유도 경기다. 81㎏급 이준환은 준수한 외모에 다부졌다. 준결승 연장전, 지친 상대를 압도하던 순간, 기습공격에 당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그는 기어코 이겼다. 앞선 패배의 아쉬움이 그제야 생각난 듯 펑펑 눈물을 쏟는다. "내가 부족했다. LA(2028년)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금메달을 염원하고 있었다. 스포츠는 살아 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 내가 유도에 흥미를 그나마 느끼는 이유는 대구 중앙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당시 교기(校技)가 유도였다. 1주일에 한 번씩 유도시간이 있었고, 사범은 대구 유도의 산 증인 한상봉 선생님이었다. 중앙중은 금메달리스트 안병근·김재엽·이경근으로 이어지는 한국 유도의 산실이었다. 중앙중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유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은 유도부가 없어져 아쉽다고 얼마 전 만난 선생님이 토로했다. 대구의 학교 엘리트 유도는 위축됐는데, 유도장은 36개로 느는 기현상을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종주국인 유도는 세계적 스포츠가 됐다. 서양선수들은 순간적인 힘과 악력이 엄청나다. 135㎏의 거구 김민종을 결승에서 한판으로 꺾은 테디 리네르를 떠올려 보라. 프랑스의 유도 영웅, 테디의 신장은 2m3㎝이다. 유도는 기술이 들어가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엎어치기에 이은 누르기·조르기·꺾기 연결동작은 예술적이다. 걸리면 손을 두드려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
하얀 유니폼의 펜싱은 아마 부르주아 운동일 게 틀림없다. 서양의 전유물이자 프랑스가 종주국인 이 종목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들어왔다. 2관왕 오상욱을 영화배우라 해도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192㎝ 체격은 서양선수를 압도한다. 쭉 뻗은 그의 팔, 양 다리를 찢는 듯한 발레리노 자세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나는 펜싱도 조금 친숙한 편이다. 역시 내가 다닌 대구 오성고는 펜싱이 교기였다. 펜싱은 일종의 고급 스포츠라 실습은 불가능하고 선수들만 옆에서 종종 지켜봤다. 단체전 금메달을 딴 구본길·도경동 선수가 오성고 출신이다. 구본길이 딴 메달은 셀 수가 없다. 오성고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펜싱 역시 없었을 것이다.
사격? 사실 인기 종목은 아니다. 그래도 결승전인데 국민된 도리 반, 맹목적 금메달의 염원 반, 그런 심정으로 공기소총 10m 결승전 TV 앞에 섰다. 아! 그런데 이건 차라리 아름다운 스포츠이다. 대구 체육고 반효진 대(對) 중국 황위팅의 마지막 승부, 미동도 없는 떨림마저 완벽히 배제된 극강의 저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역대 대한민국 100번째 금메달의 반효진도 훌륭했지만, 영화 '마녀'의 무표정 암살자를 그대로 빼 박은 황위팅은 뇌리에 남았다.
양궁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나폴레옹이 묻혔다는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남자 양궁은 홈팀 프랑스를 꺾고 정상에 섰다. 여자 양궁은 올림픽 전대미문의 10연속 금메달이다. 나폴레옹은 "활을 쏘는 저 민족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게다. 파리와 시차는 7시간. 올림픽은 한여름 밤의 향연이다. 기왕 금메달 중독에 걸렸으니, 안세영의 배드민턴이나 높이뛰기 우상혁, 골프 마저 그 높은 정상에 우뚝 선다면 이 여름 더위는 완전히 꺾일 것이다.
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