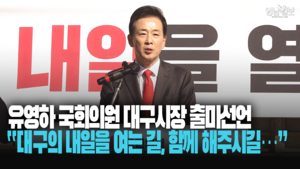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김학조 (시인·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
시집을 두어 권 챙겨 들고 동네 카페로 갔다. 꽤 자주 들르는 곳이라 주인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니 눈길이 책을 스쳐 갔다. '혼자서 얼마나 있으려고 책을 들고 왔나?' '요즘도 책을 읽는 사람이 있나?' 눈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괜히 주눅이 들어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지나가며 "책 읽기 좋은 가을이네요"라고 했다. 그동안 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을 뿐 딱히 가을이 책을 읽기에 적합한 계절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카페 주인의 한마디에 덤으로 가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작가가 작품을 쓰는 일을 산고(産苦)에 비유하곤 한다. 낱말 하나를 어디에 앉힐지까지도 깊게 고민하며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탄생 못지않게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축하해준다. 시집을 들고 카페에 온 것도 '책 잘 받았다' '잘 읽겠다' '축하한다'라는 식상한 표현 말고 공감의 한 줄이라도 전하고 싶어서였다. 시를 읽고 공감을 막상 문장으로 옮기려면 쉽게 되지 않는다.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읽는 것이 진지한 독서일 것이다.
얼마 전 한 단체가 주관하는 독후감쓰기 대회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유튜브나 쇼츠 중심의 콘텐츠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시간을 꽤 들여 독후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짜 맞춘 듯 틀에 박힌 듯이, 귀와 눈으로 수집한 정보가 마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온 듯한 독후감도 제법 많았다. 독후감은 글자 그대로는 '책 읽은 후의 느낌'이다. 이 '느낌'은 줄거리 요약이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재해석하고 작가가 찾아가지 못한 의미까지 찾아내야 한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중, 세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장면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집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묻는 문제가 있었다. 답은 당연히 세 명이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림 속 댓돌 위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를 가리키며 방 안에 있는 할머니까지 모두 네 명이라고 했다. 독후감이 그런 것 같다. 눈에 보이는 셋 외에 고무신으로 유추되는 할머니를 읽어내는 눈, 즉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 말이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세계로 확장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날, 필자는 그렇게 읽어낸 깊은 한 줄을 써서 시인에게 답신을 보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다.
김학조 <시인·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