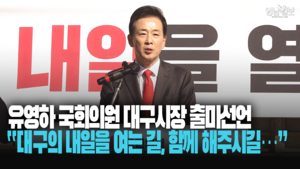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여혁동 〈시인·대구문인협회 부회장〉 |
'프레임'은 1987년에 국어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로, 태생이 40년도 안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 [명사]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뼈대 2. [의존 명사] 볼링에서 한 경기를 열로 나누었을 때의 하나를 세는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며, 영어사전에는 "1. [명사] 틀, 액자 2. [명사] 뼈대 3. [동사] 틀에 넣다, 테를 두르다 4. [동사](거짓 증거로) 죄(누명)를 뒤집어씌우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사로만 등재되어 동사로 쓸 때는 '프레임을 씌운다'로 동사를 붙여서 쓰고 있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근간으로 요즘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프레임'은 "사물이나 현상을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틀"이라고 할 수 있고, '프레임 씌우기'는 "특정한 이슈를 자기 또는 자기편에게 유리하게, 상대 또는 상대편에게 불리하게 재구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 씌우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지만, 인식 못 할 때도 많고,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줄 때가 많다. 때에 따라서 어떤 주장이나 의도를 전할 때 동의하거나 공감하도록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고, 상대의 주장에 모순이나 편견이 있음을 들춰내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 체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립 관계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상대에게 불리하게 의도된 틀을 설정하여 주장하다 보면 스스로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경청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주장만 강해져 대화의 시간과 타협의 공간이 없어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어 점점 더 아전인수의 길로 치달아 날조된 '프레임'의 길만 걸을 것이다.
갈 때까지 다 간 길 끝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부로 넘어간 듯하다. 특히, 남발된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개헌의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1987년에 '현행 헌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으며, 1987년을 기점으로 작금의 '진영갈등'이 잉태되고, 1987년 '프레임'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다. 그 무렵 태동한 진영대립의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되어온 망국의 프레임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여혁동 〈시인·대구문인협회 부회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