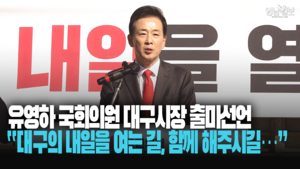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내곡천 중부에 위치하는 중화저수지. 1962년 안정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둑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2018년에 둘레길을 조성했다. |
대가야읍내를 지척에 두고 쓱 스쳐지나간다. 찰나지만 주산의 지산동 고분군을 한눈에 담는다. 길은 주산의 뒤편으로 이어지는데 읍내와 퍽 다른 풍경이다. 행정구역상 대가야읍에 속해있지만 들 넓고 한적한 농촌이다. 들 너머 우륵박물관의 돔 지붕을 확인한다. 저곳에 간 지 십수 년이 흘렀네. 차창에 저수지 둑이 가득 들어찬다. 둑은 십수 년 전에도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다. 산비탈에 붙어 그늘지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잠시 오르자 시퍼런 저수지가 나타난다. 대가야읍 중화리의 중화저수지다.
2018년 저수지 한바퀴 도는 3.6㎞ 둘레길 조성
인근마을 마지막 대가야왕 피란 전설 전해져
중화 2리는 정유재란 '둔덕대첩' 역사의 현장
우륵공원엔 습지원·암석원·쉼터·놀이터 갖춰
 |
| 산길은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의 일부다. 가파른 산이지만 계단이 잘 되어 있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은 없다. |
◆ 진달래꽃 마을의 비단길 저수지
중화1리 마을회관 맞은편에 중화저수지 주차장이 있다.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가얏교 입구다. 너른 광장에 가야금 조형물이 있고 벤치와 작은 무대, 그리고 중화1리의 유래를 새긴 큼직한 화강석이 서 있다. 중화1리는 화갑(花甲)이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온 산을 뒤덮어 화산이라 불린 데서 유래했다. 대가야의 왕이 피란 갈 때 궁녀들이 이 마을에 머물렀는데, 궁녀들을 꽃에 견주어 화갑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화갑리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중화갑이라 불렀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화'가 되어버렸다. 화갑은 진달래꽃 마을이다.
중화1리와 2리, 그리고 인접한 저전리와 내상리, 신리를 모두 합해 '낫질'이라 부른다.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벌한 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 마을에 '납시었다'고 하여 '나실'로 불리던 것이 변했다고 한다. 또는 대가야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의 아들 월광태자와 그의 아내인 무후황후가 피란한 길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낫'은 '비단(羅)'에서 나온 말이라 하고, '질'은 '길'의 경상도식 된 발음이다. 그러니까 낫질은 비단길이다. 고령사람들은 중화저수지를 '낫질못'이라 부른다. 결론을 소리 높여 외치자면, 중화저수지는 진달래꽃 마을의 비단길 저수지다.
 |
| 우륵공원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습지원, 암석원, 쉼터, 잔디마당, 놀이터 등이 넓게 자리한다. |
◆ 둘레길 따라 한바퀴
중화저수지는 주산과 미숭산 문수봉, 사월봉, 용수봉을 분수계로 하는 내곡천 중부에 위치한다. 내곡천은 낙동강의 지류로 건기에도 좀처럼 마르지 않는 개울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1962년 안정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둑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2018년에 둘레길을 조성했다. 중화저수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거리는 3.6㎞정도 된다. 도로와 나란한 우륵생태둘레길이 1.5㎞. 산자락을 타고 오르내리는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이 1.1㎞다. 주차장 광장에서 둑을 향해 나아간다. 물가에 의자를 내놓은 집도 있고 저수지를 전망으로 가진 카페도 있다. 얼고 있는 건지 녹고 있는 건지 모를 수면에는 물새들이 얼음의 가장자리에 늘어서 있다. 발 시리겠단 생각을 하다 아, 새들도 발이 물에 젖는 건 싫어하지 라고 생각한다.
딸랑거리는 열매를 여태 매달고 선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를 지나 둑으로 향한다. 저 멀리 어슷어슷 내려서는 산들의 마지막 삼각형 하늘 속에 금산재 구름다리가 희미하게 보인다. 저수지 너머 먼 가야산 자락 능선은 어제의 눈으로 하얗다. 땅은 아늑하고 시야는 후련하다. 둑 끝에서 산을 오른다. 산길은 금산재를 넘어 우륵박물관을 지나 이어지는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의 일부다. 강화도에서 뱃길로 고령 개경포에 들어온 대장경은 합천으로 넘어가는 세 갈래 길을 만나는데 덕곡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 쌍림 반룡사 길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낫질로 넘어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 낫질길이 가장 중심 길이면서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한다. 낫질재를 넘으면 곧바로 해인사가 있는 합천군 야로면과 통한다. 옛날에는 천변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루었을 것이다.
가파른 산이지만 계단이 잘 되어 있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은 없다. 소나무 줄기 사이로 저수지가 내려다보인다. 화갑도 보인다. 봄이면 벚꽃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나리와 원추리, 가을이면 쑥부쟁이와 개망초와 각종 들국화들이 못 주변을 가득 메운다고 한다. 이곳의 진달래는 유난히 예뻐서 옛날 이 동네의 처녀 총각들은 연서의 맨 위에 진달래 꽃잎을 붙여 보냈단다. 그러면 꽃편지가 사랑을 이루게 해 주었다고. 흐뭇한 이야기다. 산길은 천천히 가얏교 앞으로 내려선다. 여기서 키 큰 낙엽수들이 늘어서있는 멋진 흙길을 조금 걸으면 우륵공원이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습지원, 암석원, 쉼터, 잔디마당, 놀이터 등이 넓게 자리한다. 우륵공원에서 무지개 목교를 건너면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은 미숭산 방향으로 떠나가고, 저수지 곁의 우륵생태둘레길을 따라가면 원점이다.
 |
| 우륵공원에서 본 중화저수지. 가얏교 우륵정 지붕 위로 금산재 구름다리가 희미하게 보인다. |
◆ 둔덕대첩의 현장
무지개 목교 아래로 내곡천이 저수지로 흘러든다. 상류는 온통 갈대밭이다.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우륵교 너머 소복하게 자리한 마을은 중화2리 '덕촌'이다. 옛날에는 '둔덕'이라 불렀다고 한다. 다리에서 바라보면 길은 꼭 덕촌에서 끝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전리와 내상리, 그리고 미숭산 자연휴양림 아래의 신리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땅도 넓어 도로가 끝나는 곳까지 평야다. 평야는 항아리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병목이 되는 자리가 덕촌이다. 선조 30년인 1597년, 일본이 조선을 재차 침략했을 때 저곳에서 전투가 있었다.
 |
| 내곡천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우륵교 너머 소복하게 자리한 마을은 중화2리 '덕촌'으로 정유재란 둔덕대첩의 현장이다. 덕촌은 근래 둔덕으로 바뀐 듯하다. |
정유재란을 일으킨 일본은 임진왜란 때와 달리 하삼도(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완전히 점령한 뒤 북상하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군은 의령과 삼가를 거쳐 성주 방면으로 밀려옴과 동시에 낙동강을 거슬러 북상해왔다. 8월 초가 되자 다이라 스키마스(平調益)가 이끄는 왜군 1천여 명이 고령방면에 나타났다. 그들은 고령 서남방 둔덕에 주둔하여 가교를 설치하고 요새를 구축하는 등 본군의 북상을 돕기 위한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때 금오산성을 지키고 있던 정기룡 장군이 기병 150명, 보병 800명을 거느리고 고령으로 달려온다. 그리고 먼저 적장 다이라를 생포해 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병을 협곡으로 유도해 전멸시켰다. 이 전투를 '둔덕대첩'이라 부른다.
'덕촌'은 근래 '둔덕'으로 바뀐 듯하다. 버스정류장에 중화1리 화갑, 중화2리 둔덕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쟁은 먼 이야기고, 오늘의 둔덕과 화갑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저수지 주차장에 내린 노부부가 우륵공원 방향으로 걸음을 시작한다. 광장 벤치에 앉아 책을 보던 아저씨는 아직도 그 자리다. 가얏교 한가운데 자리한 우륵정에 오른다. 코발트 빛 물은 깊이를 모르겠고 금산재 구름다리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다. 누군가 있었다면 크게 팔을 흔들어 주었을 텐데. 햇빛은 근래 드물게 부드러워서 봄이 금산재를 넘어 오고 있는 듯하다. 봄날에 진달래 꽃잎이나 따러 올까. 글·사진=류혜숙 여행칼럼니스트 archigoom@naver.com
■ 여행 Tip
12번 대구광주고속도로 동고령IC로 나간다. 동고령IC삼거리에서 우회전해 가다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지나 좌회전해 26번 국도에 올라 직진한다. 회천교 건너 고령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직진, 본관교차로에서 오른쪽 본관리 쪽으로 빠져나가 고령, 덕곡방향으로 좌회전, 본관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나가 직진한다. 고령중학교 지나 우륵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해 직진하면 된다. 가얏교 입구와 우륵공원에 주차장이 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