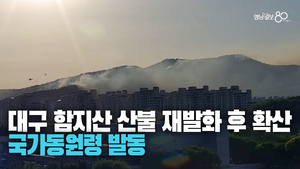![[신용목의 시와 함께] 봉주연 해령 부분](https://www.yeongnam.com/mnt/file/202503/2025031001000242000010641.jpg) |
| 시인 |
귀 대신 푸른 조개껍데기를 달고 있다면
얼굴마다 연안으로
목소리마다 파도로
스스로에 의해 채워지는 밀물
바닥이 잠겨갔다.
나로부터 남는 것은 내 마음뿐이야.
이 집은 나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중략)
너는 누구니,
누군데 자라났니,
너는 무엇으로 너를 객관하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랑을 보면 불안했다.
봉주연 '해령' 부분
이 시는 세계(집)와 나(마음)의 불화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자라난 마음에 대해 재차 물으며 자기 자신과도 불화한다. 이 불화는 인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잠든 한 명이 다른 이를 옭아맨 채로 속삭였다/ 어디까지를 우리라 불러야 할까'라는 구절로 이어지고, 다시 몇 행간을 건너 '우리는 너무 일찍 서로의 생활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족 혹은 연인에 가닿는다. 끝내 '객관'일 수 없는 사랑은 영원히 불안하다. 그러니 여기서 죽음의 주인은 '나' 자신일 것이고 '우리'는 그 장례식의 긴 추도사로만 가능할 것이다. 바로 서로의 생활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1.9be260829751402fab3aa2a0703ff92f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