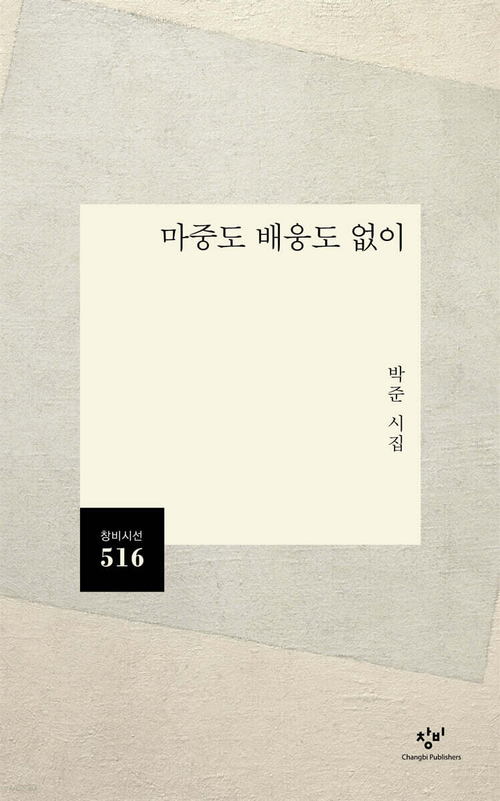
마중도 배웅도 없이/박준 지음/창비/112쪽/1만2천원

새 시집 '마중도 배웅도 없이'로 7년 만에 돌아온 박준 시인. <영남일보 DB>

박준 시인이 새 시집 '마중도 배웅도 없이'를 펴냈다. 살면서 놓쳐버린 것들의 빈자리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눈에 띈다. <게티이미지뱅크>
"살기가 온기였는지/ 온기가 살기였는지// 묻은 것 없고 묻어날 것도 없이/ 다짐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으로/ 새벽을 처음 가르는 눈처럼// 다시 올 거라면/ 너는 그렇게 와"('잔치' 중)
일상의 순간을 투명한 언어로 포착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박준 시인이 7년 만에 돌아왔다. 새 시집 '마중도 배웅도 없이'를 펴냈다. 앞서 시인은 전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집은 여전히 그리움과 상실을 아릿한 아름다움으로 그려내면서도, 더욱 깊어진 성찰과 섬세해진 시어로 전작들을 뛰어넘는다. 특히 살면서 놓쳐버린 것들의 빈자리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눈에 띈다. 박준의 위로가 고요히 존재하는 삶들에 불어넣는 숨결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
시인이 '당신'이라 부르는 대상은 단순한 인칭을 넘어 '존재의 높은 이름'으로 자리한다. "하나의 답을 정한 것은 나였고/ 무수한 답을 아는 것은 당신이었다"(귀로)는 구절처럼, 시인은 삶의 주변부에 화자를 두며 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높인다. 그곳에서 발견한 소박하지만 숭고한 사람들의 언어와 삶이 풍부하게 담겼다. "삶은 너머에 있지 않았고 노래가 되지 못한 것만이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라는 '공터'도 그렇다.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만/ 따라 부르다보면// 중간중간/ 노랫말을 잊겠지만// 그리하여 여음으로만/ 사이를 채워야 하겠지만// 이제 어느 누가/ 이를 잘못이라 하겠습니까"('초승과 초생' 중)
박준은 절제된 언어로 독자에게 다가간다. 그 여백 속에 감정을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다.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울림을 전한다. 이는 시인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음을 미음처럼'에선 미음을 끓이는 행위가 "나는 아직 네게 갈 수 없다 합니다"로 마무리된다.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크게 다가와 읽는 이로 하여금 상실의 무게와 그 안의 애잔한 온기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마중도 배웅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들 앞에서는 그냥 양손을 펴 보일 거야. 하나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눈을 가까이 대고 목숨이니 사랑이니 재물이니 양명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 읽을 필요는 없어. 이제 모두 금이 가고야 만 것들이야."('손금' 중)
이번 시집에 대해 이제니 시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다 끝내 보내지 못한 사람, 보내고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 그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독자의 슬픔을 위로하려 들지 않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함께 앉아 조용히 등을 내어준다"고 평했다.
박준 시인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신동엽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편운문학상, 박재삼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이다.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T1.jpg)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2/news-a.v1.20260227.d06eea0aaf934bcc9e87399f285ed370_T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