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가창 이필영 할머니 시집 출간
근현대사 축소판 같은 굴곡진 삶
둘째 며느리가 받아적고 편집도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감정 담겨"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97세의 나이세 시집을 펴낸 이필영 할머니.<이현경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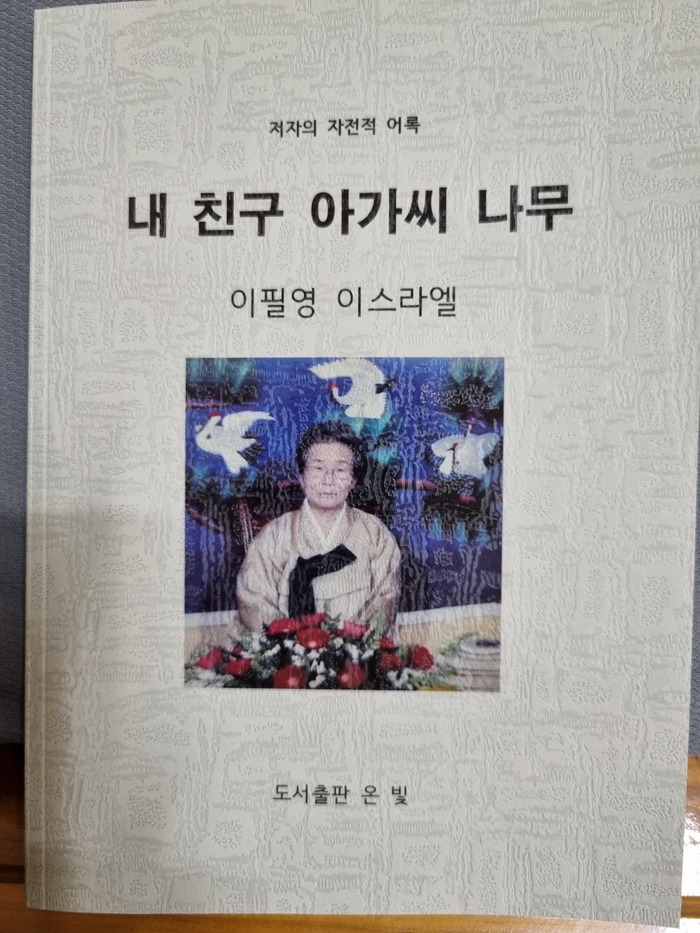
이필영 할머니가 펴낸 시집 '내 친구 아가씨 나무'.<이현경씨 제공>
백세를 앞둔 할머니가 '말'로 쓴 시집을 펴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사는 이필영(97) 할머니 이야기다. 이필영 할머니는 글을 따로 배운 적이 없다. 학력도 일제강점기 소학교(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하지만 평생의 삶과 감정을 입으로 풀어내면 그것은 곧 시가 된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둘째 며느리 이현경(74)씨가 '할머니의 말들'을 받아적어 책으로 엮었다. 그렇게 나온 시집이 '내 친구 아가씨 나무'다.
'메누리가 멫버이나 물었지만서도/ 한 번도 못 내놓는 울 엄마 이름/ 메누리가 찾았다미 연필 잡고 써보란다/ 내 나이 열세 살에 세상 베린 울 엄마// 오천 정씨 란자, 용자,/ 정 란용이란다// 나이 구십 넘도록 한 번도 못 불러본 울 엄마 이름' ('울 엄마 이름' 중)
99쪽, 30여편의 시로 구성된 시집에는 어르신이 평소 툭툭 던진 진심이 담겨 있다. 생생한 표현과 유머가 읽는 이의 마음에 와닿는다. 특히 열세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다. 그는 지금도 어머니를 회상하면 '울 엄마'라 부르며 그리움을 삼킨다. 시 '울 엄마 이름'에는 그런 감정이 특히 잘 담겨 있다. 평생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이름은 알지 못했던 사연이 절절하다. 짧은 인연과 기록의 부재로 성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긴 세월이 흐른 뒤, 이사 과정에서 며느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아내며 비로소 어머니의 이름 '정란용'을 알게 됐다. 그 순간 그는 "엄마, 미안합니다"란 말만 되뇌며 오열했다.
시집에 드러난 이필영 할머니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1928년 경주에서 태어나 열일곱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산업화 시기를 모두 겪었다. 3남4녀를 키우기 위해 사업 실패와 재기를 거듭하며 살림을 일궜다. 타이어 공장 운영이 실패로 끝난 뒤 단무지 공장을 차려 사업을 확장하면서 집안 경제를 일으켰다. 신앙 생활에도 힘써 소록도 봉사, 이스라엘 성지순례 등에 나섰다.

이필영 할머니(오른쪽)가 며느리와 함께 산정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이현경씨 제공>
시집 출간은 둘째 며느리 이현경씨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았다. 편집·초고·퇴고는 물론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도 받았다. 며느리 이씨는 4년 전부터 이필영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시집은 출간된 후에야 처음 내놓았다. 당시 시집을 받아든 이필영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들인 남편 역시 목이 메어 힘들게 낭독했다.
며느리 이현경씨는 "들어 알고 있던 어머님은 집안의 권위자 같았는데, 함께 살아보니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심성을 지닌 분이었다"며 "흘려 듣기에는 아까운 말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시집을 펴낸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시집에는 어머님만의 진솔한 감성과 서정성, 원색적인 응어리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그 시대를 살아내느라 갈고 닦을 기회를 얻어보지 못했을 뿐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감성이 숱하다"고 시집을 소개했다. 시집을 읽은 한 독자는 "만 98세에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시바다도요 할머니의 시를 읽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읽을수록 재미가 나서 필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윤자 시민기자 kscyj83@hanmail.net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