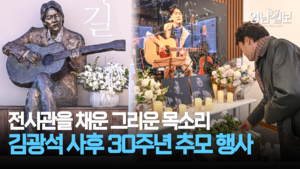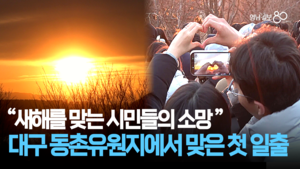손가락 두 마디 잘라 ‘조선독립원’ 혈서…세계에 독립의지 알려

남자현(南慈賢, 1872∼1933) : 영양→서울→압록강→만주 통화현→청산리 전투→서울→하얼빈

영양에 있는 남자현지사역사공원 입구의 남자현 지사 동상. 혈서를 쓰기 위해 단지(斷指)한 넷째 약지까지 섬세하게 재현한 동상에서 남자현 지사의 올곧은 기개가 느껴진다.
영양 의병반대 정신적 지주役 친정
남대문교회 중심 서울 만세운동 참여
무장 독립운동단체 서로군정서 가입
안창호 등 독립지사 47명 석방 앞장
하얼빈서 무기 옮기던 중 日에 체포
혹독한 고문에 단식으로 세상 버려
남편 피 묻은 전투복 속옷으로 간직
기미독립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번져가던 1919년 3월9일 새벽, 47세 여인 남자현이 아들 김성삼과 함께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에서 만주행 기차에 오른다. 아버지 김영주가 청송 진보 전투에서 순국한 1896년 연말에 유복자로 태어난 성삼은 지금 23세이다. 그는 급히 상경하라는 어머니의 연락이 오자 즉시 고향(경북 영양)을 출발, 안동과 김천을 거쳐 이곳에 당도했다.
어머니의 전언은 "만세운동으로는 안 된다. 중국 가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요지의 단문이었다. 성삼은 어머니의 생가이자 자신의 생가인 영양 석보면 지경리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꼭 어머니를 도와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고 국권회복의 대명천지를 회복하고야 말겠습니다'하고 다짐했다.
'외할아버지(남정한)는 정3품 경력과 영남 거유라는 위엄을 바탕으로 영양 지역 의병부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셨지. 그 때문에 아버지 순국 2년 뒤 극심한 고문을 당해 하세하셨어. 그 뒤 한동안 실종 상태였던 외삼촌(남극창)도 결국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됐어. 어찌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

영양 산해리 5층 모전석탑. 강변에 자리한 이 석탑은 사찰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됐다. 남자현 지사는 이 석탑을 안타깝게 생각해 직접 잡초를 뽑기도 했다.
남자현은 아들 성삼에게 중국으로 망명하자는 서한을 보낼 때, 남편의 무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뜻 걱정에 사로잡혔다. '반변천 봉감탑처럼 되고 말겠지….' 공식 명칭이 '영양 산해리 5층 모전석탑'인 이 통일신라시대 탑은 대한민국 국보로, 소재지가 봉감마을이라는 데 근거해 흔히 '봉감탑'이라 불린다.
우리나라 절은 대체로 산사인데, 특이하게도 강변에 세워진 봉감탑은 사찰이 폐사되고 자연스레 관리 부실에 빠졌다. 남자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도 안동 임청각(이상룡 생가) 앞 법흥사터 7층전탑만큼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봉감탑이 터무니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런 마음이었으므로 어떤 날은 인근 농가에서 사다리를 빌려 탑 2∼3층 지붕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기까지 했다.
'왜놈들은 자기들 섬에 있는 것만 국보로 인정할 뿐 우리 문화유산은 홀대하고 있다. 나라를 되찾게 될 날을 생각하면 우리 것은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가꿔 놓아야 마땅하지! 봉감탑 바로 앞 반변천을 흐르는 강물은 흥구리 강변 모래밭과 산기슭에 붉게 떠돌고 있는 남편의 피를 멀리 바다까지 실어 하늘로 올려줄 고마운 존재야. 그것을 봉감탑이 지켜보고 있어!'

영양 석보면의 남자현 지사 생가. 남자현 지사의 후손과 영양군이 1999년 복원했다.
남편 사후 남자현은 유복자 성삼을 삼대독자로 낳았다. 일을 해서 가정경제를 꾸려갈 남자가 없는 집이었으니 그녀는 온갖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러면서 쓸쓸한 삶을 달래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쌓고, 교회를 통한 인맥을 널리 구축했다.
1919년 2월 교회 일로 가까이 지내던 서울 남대문통 거주 김씨부인이 만세운동 관련 사전 알림을 보내왔다. "3월1일 독립을 선언할 것입니다. 자매도 올라와 힘을 보태세요" 남자현은 그 길로 상경했다.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만세운동에 참여한 남자현은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제는 평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3∼5월 동안 하루 평균 81.6명의 한국인이 죽임을 당했다.
"만세시위로는 국권회복이 불가능하다. 남편과 아버지와 오빠의 원수를 갚을 수도 없어. 총칼을 들고 담대하게 싸워 왜놈들을 몰아내야 해. 만주로 망명해 이상룡, 김동삼 등 일찍부터 그곳에 가서 고생하시는 독립지사들을 도와야 한다!"
당장 상경하라는 말을 인편으로 아들에게 보냈다. 그 순간, 23년 전에 죽은 남편이 떠올랐다. 아니, 남편의 묘소가 눈에 선했다.

영양 남자현지사 역사공원. 남자현 지사의 발자취와 정신적 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조성됐다.

영양 산해리 5층 모전석탑. 남자현 지사는 강변에 방치된 이 불탑을 안타깝게 여겨 탑과 주변을 가꾸기도 했다.
'잡초가 숭숭 돋은 봉감탑 지붕처럼 남편 무덤도 머잖아 그 모양으로 황폐해지겠지…. 그렇다고 산소만 지키고 앉았을 수는 없어….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무거우니(君臣義重) 아버지의 은혜는 가벼이 하리(父子恩輕)라는 말을 국오(남편 김영주) 선생이 모를 리 없는 일!'
'군신의중 부자은경'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죽음에 내몰린 동래부사 송상현이 피신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역사의 명언이다. '내가 자신의 유택을 버려둔 채 독립운동차 압록강을 넘어간다 해 국오가 탓하지는 않으리.'
그런 헤아림에 잠겨있는 남자현에게 아들 성삼이 말한다. "누가 봐도 상인인 줄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자는 완벽하게 떠돌이 행상차림이다. 남자현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속으로는 아들 몰래 되뇐다. '내 속옷을 보면 너도 그리 말하지는 못하리라.'
중국 만주 통화현에 닿은 남자현은 곧장 서로군정서에 가입했다. 서로군정서는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상룡, 이시영 등이 세운 군사 무장 독립운동단체였다.
남자현은 군사들 뒷바라지를 하던 중 1920년 8월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을 피해 백두산을 거쳐 지린성으로 옮긴 서로군정서를 따라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다. 우리 군사들은 나이도 많고, 간호 등 활동도 많은 남자현을 '독립군의 어머니'라 불렀다.

영양에 있는 남자현 지사 추모각. 서로군정서를 따라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남자현 지사를 독립군 군사들은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1925년 채찬 등 지사들과 함께 사이토 총독 주살 계획을 세운 뒤, 탄환 여덟 발이 장착된 권총 한 자루를 직접 들고 서울로 잠입했다. 남자현은 서울 혜화동 28번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기회를 노렸으나, 삼엄한 경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8년 길림에서 나석주 의사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던 안창호 등 주요 독립지사 47명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이때 남자현은 중국 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전원 석방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 활약했다. 이 일로 한국인 사회에서 남자현 지사의 지명도가 크게 높아졌다.
1931년 김동삼 지사가 사돈인 이원일 지사와 함께 붙잡혔다. 김동삼 지사는 이원일 지사와 남자현 지사와 새로운 독립운동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 길이었다. 남자현 지사는 국내로 호송되는 김동삼 지사를 중도에서 탈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촉박한 시간 탓에 성공하지 못했다.
1932년 9월 일본의 만주 침략 실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국제연맹 조사단이 하얼빈에 왔다. 남자현 지사는 왼손 넷째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 혈서를 썼다. '조선독립원(朝鮮獨立願)'이 붉게 아로새겨진 흰 천과 그녀의 잘린 손가락을 들고 인력거꾼이 조사단 숙소를 향해 달려갔다. 이 일은 한국인의 강렬한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활동으로 아로새겨졌고, 이때부터 남자현은 '여자 안중근'이라 불리게 됐다.
1933년 남자현 지사는 3월1일 만주국 건국일 행사 때 부토 주만주국 일본전권대사를 처단하기 위해 무기를 옮기던 중 하얼빈 교외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영양 남자현지사 역사공원 호국인물 상설전시관 내부. 남자현 지사는 1933년 만주국 건국일 행사때 무기를 옮기던 중 하얼빈 교외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됐다. 남자현 지사는 스스로 생명을 끊기로 결심,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남자현 지사가 사경에 이르자 일제는 8월17일 병보석 조치를 시행했다. 고문 치사가 아니라 병사라는 기록을 남기려는 얄팍한 술수였다. 마침내 8월22일 남자현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가 아니라 정신에 달려 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리 민족 곁을 떠났다.
남자현 지사가 세상을 버린 직후, 망자의 옷을 벗기던 사람들은 아연실색 얼굴빛이 샛노랗게 변하고 말았다. 지사의 속옷은 핏자국 얼룩덜룩한 남자 의병 전투복이었다. 순국한 남편이 숨을 거둘 때 입고 있었던 그 피옷을 남자현 지사는 평생에 걸쳐 속옷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아, 남편의 삶과 죽음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영양에 자리한 남자현지사항일순국비. 남자현 지사는 1933년 세상을 떠났고 후대는 남자현 지사는 '독립군의 어머니' '여자 안중군'으로 우러러 봤다.
지사 타계 48주기인 1981년 봉감탑이 해체와 수리를 거쳤다. 타계 66주기인 1999년에는 남자현 지사 생가 복원과 사당 건립이 이뤄졌다. '독립군의 어머니'이자 '여자 안중근'으로 우러름 받는 남자현 지사의 숨과 피가 민족정기로 살아있는 영양땅이 우리를 부른다.
글=정만진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박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