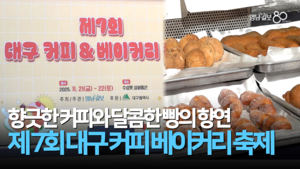박혜경 한동대 부총장
"문송(文悚)합니다." '문과라서 송구하다'는 이 자조적 표현에는 인문학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담겨 있다. 언젠가부터 인문학은 취업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스럽게 진로 선택에도 위축이 따랐고, 문과 전공자 스스로도 경쟁력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러나 기술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문송'의 시간은 저물고 있다. AI가 코딩을 대신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자, 인간에게 남겨지는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정답을 생성하는데 탁월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예컨대 저출생 문제를 두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은 왜 출산을 주저하는가", "행복과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탱되는가"와 같은 근원적 질문들은 기술이 아닌 통찰에서 나온다. 질문의 질이 사고의 깊이를 가르고, 결국 그 사람이 만들어낼 세계의 범위를 결정한다. 세상과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야말로 인문학의 첫 번째 힘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인문학을 전공했거나 깊이 탐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 시절 서예와 인문학 수업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길렀다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애플의 DNA에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기술이 교양과 인문학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힘, 그것은 본질을 향한 질문의 능력에서 출발한다.
인문학의 두 번째 힘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상상력이다. AI 윤리는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 의료 기술은 과학과 인간 존엄성 간의 숙고를 요구한다. 기후 위기는 경제학과 생태학, 정치와 윤리가 얽혀 있다. 다양한 가치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 경계를 넘어 사유를 확장하는 힘은 인문학이 길러 온 자산이다.
세 번째 힘은 공감의 감수성이다. AI는 정보를 계산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역사 속 인간의 선택을 성찰하거나 다양한 문화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묻고,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배우는 일은 우리를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운다.
이제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훈련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 정보의 암기를 넘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분절된 사고를 넘어 통합적 사유가 요구된다. 이제 '문과'와 '이과'라는 이분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진짜 문제는 '문과라서 송구함(文悚)'이 아니라 '질문하지 못해 송구함(問悚)'이다. AI가 모든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무엇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이것이 정말 바른 방향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인간다움이다. 그 핵심에는 질문하고 성찰하며 연결하고 공감하는 능력, 곧 인문학이 수천 년간 길러온 힘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문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문행(問幸)합니다. 질문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AI 시대, 질문은 인간다움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써 내려갈 첫 문장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