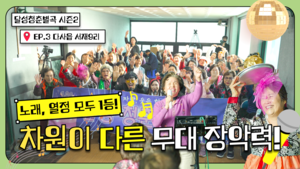|
| 유영철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
'북미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수출계약' '평택에 5천평 규모 공장 증설' '본격적인 전기오토바이 시대 연다'….
지난 2월에서 5월, 신문(주로 경제지)에 실린 이 같은 헤드라인의 '기사형태의 글'을 보고 투자자들이 몰렸다. 알려진 바로는 200여 명이 백억대를 투자했다고 한다. 곧 상장될 것이란 '베노디글로벌'이란 기업은 그러나 실체가 없는 허구였다. 수출계약, 공장증설 등은 사기였다. 최근 불거진 사건이다.
'기사형태의 글'은 기사(記事)는 아니다. 광고(廣告)다. 그러나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바람에 '기사'로 속기 쉽다. 이름도 기사와 광고를 혼합한 '기사형 광고'라고 부른다. 본래 기사는 기자가 확인 취재해서 쓰고 기사 칸에 실리며 기사 쓴 대가를 돈으로 받지 않는다. 책임도 기자가 진다. 반면 돈을 받는 광고는 광고주의 요구가 반영되며 광고 칸에 싣고 언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뢰 여부는 독자의 몫이다. 그런데 기사형 광고는 돈을 받으면서도 광고 자리가 아닌 기사가 실리는 자리에, 기사가 아니면서도 헤드라인과 부제 등 제목도 붙이고 사진도 넣고 기자의 바이라인까지도 달아 기사처럼 내놓는다. 기사라는 착각을 야기하는 사이비 기사다.
학계에서는 1951년 미국의 한 종합잡지에 실린 것을 시초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IMF 이후 언론사들의 수익성 악화 타파책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2009년 MB정권 이전에는 독자보호를 위해 혼동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같은 해 MB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신문법 등을 개정하면서 슬그머니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규정은 있어도 처벌이 없는 법이 됐다. 언론의 퇴보였다. 기사형 광고가 판을 치게 됐다. 언론의 타락이었다.
지난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전국 종이신문 68종 잡지 50종 등 오프라인 11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1천342건의 기사형 광고를 찾아냈다. 2020년 6천979건에 비해 4천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1~10위 안에는 3개의 유명 중앙지와 6개의 경제지가 포함됐다. 기사형 광고가 거의 없는 중앙지들도 있었다. 지방지에 비해 유명 중앙지와 특히 경제지가 신문법 등의 규정을 주로 위반했다. 업종별로는 유통, 건설 건재, 식품, 금융보험증권, 의료 등의 순이었다. 위반사례는 '광고 미표시'와 '광고에 '○○○기자 삽입' 등 기사 오인을 유도하는 표현'이 많았다.
신문에 기사형 광고가 넘치는 가운데 기사형 광고 전문·대행업체도 성업 중이다. 위의 사기 사건의 도구였던 '해당 기사(기사형 광고)'는 건당 20만원대에 거래됐다고 한다. 건당 20만원의 기사형 광고가 촉발한 백억대의 피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사형 광고는 비윤리적이고 반언론적이다. 진짜 기사취재에 열중인 기자마저 불신하게 만든다. 기자들은 마감 시간에 쫓기는 바쁜 직업인이다. 신문사의 수익구조 광고영업 등 돌아가는 사정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의 폐해를 기자들이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은 언론의 정도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 기사형 광고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기자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사이비 기사를 팔아먹는 언론들을 응징하기 위해 일어설지도 모른다. 그 책임을 언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유영철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