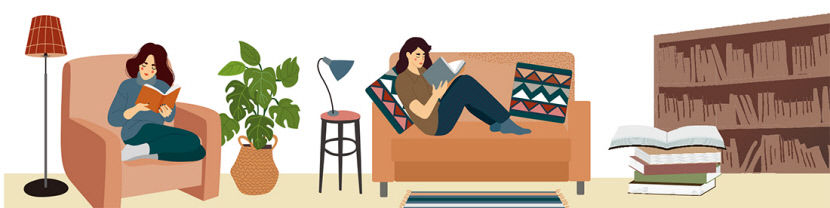 |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심해지자, 남편은 내게 '맑은 물과 공기가 최고의 건강 보조제'라는 말로 이사를 결정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결정된 이사 때문에 '싫다'라는 말을 할 기회도 없이, 퇴원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사시는 시골로 이사를 해야 했다. 남편은 부모님과 한마을에 살게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나는 은근히 화가 나 있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서는 맏아들만 챙기시느라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셨고, 남은 건 두 분이 사시는 70년 된 작은 집 한 채밖에 없었다. 이런 까닭에 큰 시숙님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시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일찌감치 훌훌 털어내 버리면서 관계마저 소원한 상태였다.
우리가 이사하자마자 큰 동서는 '짐을 덜었다'라는 말로 은근슬쩍 두 분의 봉양을 우리 부부에게 미뤄버렸다. 화가 났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아버님께서 내 눈치를 살피시는 것이 내 눈에도 확연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어선을 사들여 직업을 바꾸면서 고향 생활에 빠르게 흡수되었지만, 나는 그게 안 되었다. 몸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게 되어 도서관 출입을 제외하면 다닐 일이 없는, 그래서 겉보기에만 평온한 시골살이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시부모님의 외출 운전은 몸 상태가 조금 호전된 내 담당이 되었다. 팔순을 넘기신 두 분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했고, 수협에 간다거나 오일장을 가시는 것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었다. 우리가 이사를 오기 전까지도 아버님께서 수협과 우체국, 장보기를 모두 담당하신 까닭에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다닐 일이 훨씬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동행이었다. 나는 나대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 내가 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버님께서는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미안해서'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
이런 어색함을 깬 쪽은 아버님이셨다. 아버님께서는 그 연세에는 드물게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TV 뉴스를 이해하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셨다. 처음에는 뉴스 얘기로 말씀을 거시다가, 조금씩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들려주셨다. 도로에 개나리가 피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부업으로 산수유 열매를 까던 얘기를 하셨고, 간짜장을 드실 때는 라면이 처음에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으며 어떤 맛이었는지를 실감이 나게 들려주셨다. 콤바인이 벼수확을 하는 들판을 지나면서 '기계가 있어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신께서 몸으로만 하셔야 했던 쌀농사의 고단함을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실 때도 있었다. 아버님 말씀의 끝맺음은 항상 같았다. "그때는 그게 고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지. 힘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 그럴 때의 아버님은 전 재산을 맏아들에게 모두 넣은 미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신 윗세대의 표본으로 보였다.
하루는 아버님의 안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안과 치료를 마치면 도서관에 들를 생각이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아직 1시간 기다려야 하니 그 시간에 넌 도서관에 갔다 온나. 힘들게 둘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 책 빌릴 때는 그 책 좀 빌려와 봐라. 그게 내용이 6·25전쟁 통에 대구 교동에서 셋방살이하면서 엄마는 한복 바느질하고, 그 아들은 신문 파는 책. 그 책을 쓴 사람이 청송사람이데이."
"아! 마당 깊은 집요?"
"그래. 15년은 되었겠다.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으로 잘 봤지. 그게 책이 있다면서?"
"아버님께서 읽으시려고요?"
"돋보기를 끼고 읽으면 안 되겠나? 니 엄마가 회관에 놀러 가고 없을 때 돋보기를 쓰고 조금씩 봐야지. 니 엄마 앞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면 아주 싫어해. 자기는 글을 모르는데, 자기 앞에서 글을 읽는다고 사람 무시하냐고 하거든. 니 엄마가 기분 나빠하는 일은 하면 안 되니 엄마가 있을 때는 읽을 수 없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14일 후에는 돌려주어야 해서 장편 소설을 14일 만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인터넷 서점에 책을 주문했다. 책이 도착하고 나서 시부모님댁에 가면 아버님은 돋보기를 끼고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하지만 그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눈이 좋지 않은 데다가 돋보기를 끼니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서였다. "힘들어 못 읽겠다. 고마 니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 주면 안 되겠나?" 아버님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회관에서 돌아오셨다. 나는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어머님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계속 읽어라'라고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따라 들어가 왜 책을 읽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며느리가 똑똑해서 좋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읽어드려라. 니 아부지가 며느리 덕에 심심하지 않아 좋겠다."
어머님의 허락이 떨어져 하루에 한 번 시댁으로 가 평상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다. 아버님께서는 마당에서 남편이 걷어온 통발을 손질하시며 들으셨고, 어머님은 마루에서 경청하실 때가 많았다. 마을회관에 가셔서 그 전날 읽은 부분을 못 들으신 날이면 '어제 무슨 얘기였노? 그거 얘기해주고 오늘 거 읽어봐라'시며 책 내용에 관심도 가지셨다. 아버님께서는 내용이 당신이 경험했던 일과 비슷하다고 하시며, 피난을 갔던 이야기, 남의 집 변소 신세를 지는 통에 해야 했던 똥장군을 졌던 일 등을 읽는 도중에 얘기하셔서 마당 깊은 집 한 권을 읽는데 2개월이 넘게 걸렸다. 나중에는 책 내용과 아버님께서 겪으신 일이 뒤섞여 기억될 정도로,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된 걸 들으니 훨씬 좋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을 쓴 거라고 하니, 사는 얘기를 적어보면 어떻겠노?" 하루하루가 단조로워 적을 얘기가 없다고 하자, 아버님께서는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해주셨다. "적을 것이 천지빼까리다. 니 에미 따라 마을회관에도 가봐라. 모두 자기가 살아온 얘기가 소설 열 권은 쓴다고들 한다. 니가 시골에 살다 보면 글감이 자꾸 나올 거다. 시작이 어렵지 쓰기 시작하면 술술 잘 쓰지 않겠나?"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짧게나마 시골 생활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마당 깊은 집'을 읽을 때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아버님의 인생도 하나하나의 주제가 되어 글 노트에 채워지면서 시골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찔레순이나 산딸기를 따 먹다가도 적을 말이 생각나면 스마트폰 음성 녹음으로 저장해두기도 하고, 박주가리가 맛있는 8월이 되면 작은 배낭에 볼펜과 메모지까지 챙기며 박주가리를 따러 가게 될 정도로 일상의 글쓰기가 조금씩 생활화되어갔다.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추억 이야기는, 글을 쓰게 되면 잊지 않고 아버님께 들려드렸다. 내가 쓴 글을 듣고 나면 아버님께서는 칭찬에 이어 추억을 조금씩 덧붙여 말씀해주시는 열성적인 독자가 되어주셨다.
아버님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아버님에 대해 화남이 사라지고 있었다. 돈보다, 함께 앉아 인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더 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그때 실감할 수 있었다. 아버님과의 대화 덕분에 글의 길이도 조금씩 장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긴 글을 쓸 수 있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기쁨을 알게 된 시기였다.
하지만 세상은 늘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님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연이어 아버님께서는 '몸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에 입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틀 만에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신 거였다. 구순의 연세라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호상'이라는 말로 유가족을 위로했지만, 그토록 활기차게 당신의 인생을 말씀하시던 분이 계시지 않으니, 내게는 허전함만 남게 되었다. 큰 병 없이 구순까지 지내셨고, 단 이틀만 앓다가 돌아가셨으니 복 받은 어른이라며, 조문 온 노인들은 부러워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께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허공만 바라보는 어머님을 뵙고 나니 허전함이 배가 되어 그냥 돌아와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꽤 긴 시간을 글쓰기에서 손을 떼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100일의 추모 기간이 지나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시부모님 집 살림을 정리하면서, TV장 서랍 속에 든 '마당 깊은 집'을 보게 되었다. 책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준 아버님의 책. 그 책을 다시 펼치자 아버님과의 대화가 새록새록 생각났다. 시골 생활에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게 해주신 아버님의 마음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평상에 앉아 소리 내어 책을 읽어보았다. 아버님의 덧붙임이 없는 책 읽기는 조금 밋밋했지만,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다시 글을 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에미야! 니도 글을 써봐라. 분명 잘 할 수 있을 거다.'

박혜균 주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