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에 눈 감고 대명의리 빠져
정묘호란 겪고도 권력 팽창만 열중
"병자호란은 갑자기 닥친 전쟁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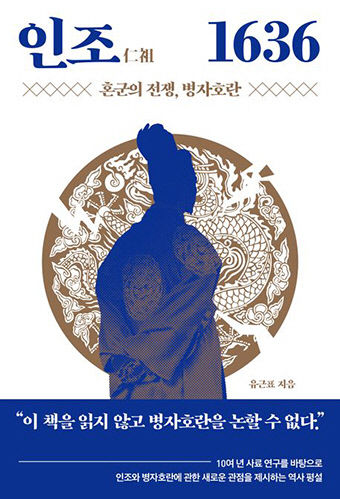 |
| 유근표 지음/북루덴스/352쪽/1만8천500원 |
당시 인조는 떠오르는 강자 후금을 오랑캐로만 봤다. 게다가 인조는 명을 부모의 나라로 떠받드는 정책을 펴고 있어,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1627년 조선과 후금 사이의 전쟁인 정묘호란이다. 이 책은 인조반정부터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들여다보며 무능한 지도자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남한산성을 답사하던 중 병자호란 때 임시수도로서 45일간 항전한 남한산성의 역사성에 주목해 병자호란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다. 이후 10여 년 넘게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1차 사료와 인조와 병자호란에 관련된 수많은 저작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 인조와 병자호란에 대해 다룬다.
 |
|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임시수도 역할을 한 남한산성. <영남일보 DB> |
저자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의 죽음에도 주목한다. 소현세자는 포로였지만 명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고 그곳에서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을 통해 서양의 과학 문명을 학습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 아담 샬에게 받은 각종 과학 서적과 망원경, 성경책을 인조에게 보여주며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그가 청에 머무는 동안 삼전도의 굴욕을 잊고 친청파로 돌아선 것으로 본다. 또 청에서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세자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아들을 냉대한다. 청에 있을 때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냉대와 의심 등으로 지병이 재발해 결국 귀국 2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저자는 당시 인조가 소현세자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삼전도의 굴욕이 전화위복이 되었을 수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조선이 17세기 중반 이미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발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인조를 위시한 서인(西人)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명나라를 섬기는 것 외에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책에선 소현세자의 죽음은 어리석은 왕인 아버지 인조의 비정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혼군(昏君·어리석은 왕)의 광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a.v1.20251031.85fcdd178eb544e5a04e034dd6778335_T1.jpg)
![[영상]경주를 물든인 K컬처 특별전… 신라의 향기, 현대 예술로 피어나다](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a.v1.20251030.20b0c9fa94af442bbb7be5d52ca7c85f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