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률 OECD1위
베르테르 효과 방지 위해
자살이란 단어 사용 회피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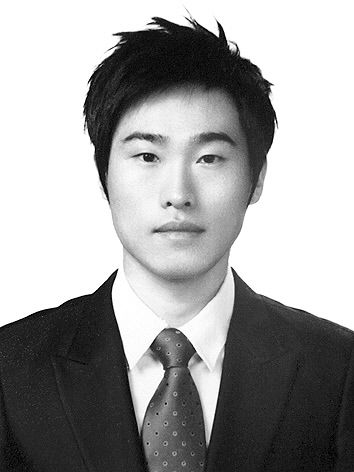 |
인간의 삶에 있어 죽음은 필연적 과정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죽음을 신성하게 여겼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의례 중 두 가지가 죽음과 관련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탄생보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죽음과 관련된 것에 대해 금기시하는 경향이 크다. 화장장이나 묘지, 봉안당 등은 기피시설이 됐고, 도심 외곽에서만 볼 수 있다. 또 말하기 자체를 꺼린다. 더욱이 그 죽음이 '일상'적이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부터 자살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른 조치다. 권고 기준에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또는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기사 본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언론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언론에서 자살이란 단어 대신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유익한가. 실험 조사를 통한 결과를 찾아보진 않았으나 결코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니, 부동의 1위다. 2003년부터 불명예스러운 왕좌에 오른 뒤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 10여 년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천352명으로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이 26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6.6명꼴, 40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살'이라는 용어가 자살률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의 유해성을 간과할 수 없다. 마치 개인의 선택에 따른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자살을 오히려 방조하는 느낌이나 인상을 주기도 한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살에 대해 왜곡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십수 년간 언론을 통해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듣고 자란 세대(10~30대)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2010년부터 미약하게나마 감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도 개선돼야 한다.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평소 정신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자신의 의지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울한 마음이 지속하거나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던 핀란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법을 통해 자살률을 낮춘 사례가 있다. 병원을 방문한 모든 환자에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 여부를 점검해 자살 고위험자를 찾아냈고, 약물치료와 상담, 사회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살 빈도를 극적으로 낮췄다. 결국, 자살 예방은 사회적 환경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히 용어를 에둘러 표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박종진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a.v1.20251031.85fcdd178eb544e5a04e034dd6778335_T1.jpg)
![[영상]경주를 물든인 K컬처 특별전… 신라의 향기, 현대 예술로 피어나다](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a.v1.20251030.20b0c9fa94af442bbb7be5d52ca7c85f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