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협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
거문고로 성정 다스리려 했던 윤선도
젊은 시절부터 연주를 하며 풍류 즐겨
금객 권해 좋아해 詩 여러 편 지어줘
그가 남긴 거문고 국립국악원서 복원
끼움 방식으로 앞판 제작된 점이 특징
조선 후기 문인들 음악생활 보여줘
 |
| 국립국악원이 2010년에 복원한 '고산유금' 앞면(왼쪽)과 뒷면. 전남 해남의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다. |
그리고 권해를 위해 '금객이 시를 구하기에 금계를 지어줌(琴客求詩 爲作琴誡)'이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욕심이 마음속에서 맑아지니(嗜慾心中淨)/ 천기가 손가락 아래 울리고(天機指下鳴)/ 산과 물을 흥기시킬 만하니(可令山水興)/ 생사를 종자기와 함께 하리(存沒子期幷)'.
1644년에는 윤선도가 권해에게 '옛 시구를 모아 반금에게 주다(集古 寄伴琴)'라는 시를 지어 주기도 했다. 맹호연, 한유, 백낙천, 이백, 두보, 도연명, 유우석 등 역대 유명 시인들의 명구를 가려 뽑아 엮어 자신의 뜻을 담아낸 시편이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사람 기이한 소리 지녔으니/ 용순금을 털고 닦아 낸다네/ 맑디맑은 일곱 줄 위에/ 용과 봉이 함께 노래하네'. 여기서 금(琴)은 중국 칠현금이고, '용순금(龍脣琴)'의 용순은 금순(琴脣)의 미칭으로 소리가 나오는 곳을 말한다. 용순금은 금순을 용으로 장식한 것을 이른다.
윤선도는 '고금영병서(古琴詠幷序)'라는 글도 남겼다. 어느 날 고금을 얻은 후 퉁겨보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후 시를 한편 읊은 것이다.
'우연히 가야(伽倻)의 고금(古琴)을 책 읽는 여가 속에서 얻게 되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한 번 퉁겨보았다. 12줄의 맑은 소리에 완연히 고운 최치원의 심적(心跡)이 드러났다. 탄식하는 가운데 한 곡조가 절로 이루어졌다. 또 생각하건대 이 물건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 버려진다면 먼지 뒤덮인 한 조각 고목에 지나지 않겠지만, 알아주는 이가 있어 쓰인다면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간에는 음률을 아는 이가 드무니 오음과 육률을 이룬 후에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하니 이에 대한 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다시 고풍(古風) 한 편을 지어 이 고금에 얽힌 울적한 심정을 토로한다.'
'거문고 있건만 알아주는 이 없어(有琴無其人)/ 먼지에 묻힌 채 몇 년이나 흘러갔네(塵埋知幾年)/ 기러기발은 반쯤 떨어져 나갔어도(金안半零落)/ 오동나무 판은 아직도 온전하구나(枯桐猶自全)/ 줄 고르고 시험 삼아 한 번 타 보았더니(高張試一鼓)/ 차가운 쇳소리 임천을 감동시키네(빙鐵動林泉)/ 서쪽 성 누대 위에서 울릴 만하고(可鳴西城上)/ 남훈(南薰)의 전각 앞에서도 울릴 만하네(可御南薰前)/ 세상에 쟁과 피리 소리 듣는 귀뿐이니(滔滔箏笛耳)/ 이러한 뜻 누구에게 전하겠는가(此意向誰傳)/ 알겠도다 도연명이 거문고에(乃知陶淵明)/ 끝내 줄을 갖추지 않은 이유를(終不具徽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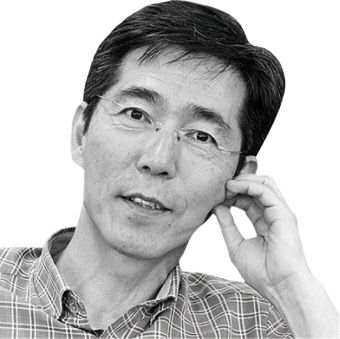 |
윤선도가 남긴 거문고 '고산유금(孤山遺琴)'이 전한다. 윤선도의 14대 종손(윤형식)이 서고에서 1982년에 찾아냈다. 발견 당시 고산유금은 뒤판 1편과 앞판 2편이 남아있었는데,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판은 오동나무, 뒤판은 밤나무로 되어 있다. 목재의 연대 측정 결과는 15세기로 나타났다. 고산유금은 현재의 거문고보다 약간 작은 편이며, 앞판은 4개의 나무 편을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해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고산유금의 뒤판 치수는 길이 130.16㎝, 최대 폭 20.05㎝, 두께 0.75㎝. 거문고의 뒤판에 '고산이 남긴 거문고'를 뜻하는 '고산유금(孤山遺琴)'이라는 후손이 새긴 글씨가 남아 있다. '고산유금' 아래 윤덕희(1685~1766)의 낙관 '윤덕희인(尹德熙印)'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1982년에 발견한 고산유금과 2010년에 국립국악원이 복원해 기증한 악기가 현재 전남 해남의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
고산유금의 앞판에는 윤선도 문집인 '고산유고(孤山遺稿)'에 실려 있는 '금객구시 위작금계(琴客求詩 爲作琴誡)'의 시가 음각되어 있다. 위에 소개한 시다.
'금객구시'의 시구 밑에는 '부용병수 제증반금(芙蓉病수 題贈伴琴)'이라 쓰여 있다. '부용병수(芙蓉病수)'는 '부용동의 병든 늙은이'라는 뜻으로, 윤선도가 보길도의 부용동 세연정에서 지낸 것에서 유래한 자호이다. '제증반금(題贈伴琴)'은 '반금에게 지어 주다'라는 의미. '반금'은 거문고를 잘 탔던 권해의 호이다. 이 명문 바로 아래 부분에 '오세손준각(五世孫刻)'이라는 문구가 음각되어 있어, 새긴 사람이 고산 윤선도의 5세손이자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손자인 윤준(1720~17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앞판에는 명문 부분이 파손되어 '양중화(養中和)'만 나타나는데, 주자의 다음 금시(琴詩)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요히 중화의 기운 기르니(靜養中和氣)/ 성나고 욕심스런 마음이 사라진다(閑消忿慾心)'.
고산유금은 앞판이 끼움 방식으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거문고의 앞판과 뒤판은 통판으로 제작된다. 고산유금도 뒤판은 통판이지만, 앞판은 4편을 끼워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립 방식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 후대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방식인지는 알 수 없다.
고산유금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음악생활 일면을 보여주는 악기 유물이다. 해남 윤씨 가문에는 고산유금뿐만 아니라 윤선도의 증손 윤덕희가 사용했던 '아양금'의 일부가 남아 있고, 거문고 악보인 '낭옹신보'가 전하고 있다. 윤선도를 비롯해 윤두서-윤덕희-윤준으로 이어지며 대를 이어 거문고 음악을 향유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윤선도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한다. '가을 밤 우연히 읊다(秋夜偶吟)'이다.
'서리 내린 성긴 대밭에 새벽바람 일고(霜落소篁動曉風)/ 한 바퀴 밝은 달 먼 허공에 걸렸네(一輪明月掛遙空)/ 숨어사는 이의 무한한 창랑의 흥취(幽人無限滄浪趣)/ 다만 거문고 몇 가락에 담겨 있네(只在瑤琴數曲中)'.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달성청춘별곡] Ep.05 달성군 화원읍, 가슴 따듯해지는 부부의 일평생 사랑 담은 노래 한자락 들어보실랍니까?](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8/news-a.v1.20250810.aabaf035f0074c4c92bc5179a0737cd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