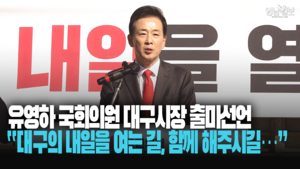클래식 수트차림의 미국 영화배우 캐리 그란트. 그가 연출한 정제된 테일러링과 직선적 라인의 수트는 성공한 멋진 남성의 복장이라는 이상적 이미지를 안겨줬다. <출처: vocal.media>
남성복 수트(suit)에서 재킷(jacket)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다. "남성의 사회적 역할, 미적 이상, 신체 인식"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적 의복이다. 남성 수트의 재킷은 화려한 장식 없이 인체의 형태에 따른 구조적 실루엣과 칼라(collar), 라펠(lapel), 주머니 등 세부 디테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형태의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칼라와 라펠의 모양, 어깨패드의 높이, 시접의 방향, 심지의 부착 정도 등 세부적인 요소들이 섬세하게 디자인에 적용된다. 즉, 수트의 재킷은 몸을 설계하는 구조적 미학의 옷이다. 영화 킹스맨에서도 '수트는 현대 신사의 갑옷이다'라는 대사가 있듯이 수트는 현대 비즈니스 사회에서 방탄복이자 매너로 완성된 모습을 그려준다.
17~18세기 유럽의 화려한 귀족 복식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과시적 복식은 몰락했다. 귀족의 금빛 장식 대신 산업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며 단정하고 실용적인 수트가 새로운 미덕이 됐다. 즉, 의복인 더 이상 신분을 과시하는 장식이 아니라, 직업과 합리성의 상징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회 구조의 전환이었다.
현재 부유한 계층을 이르는 부르주아(Bourgeois)는 프랑스어로 도시 또는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전후 귀족들과 달리 '노동과 능력으로 부를 얻은 신흥계층'으로 부상한 계급을 부르주아로 지칭했다. 이들은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와 교양으로 자신을 만든 계급이었다. 이들은 성공과 실용적 품격을 강조해 검정, 남색, 회색 계열의 단정한 수트를 선호했고, 이 변화는 근대 남성복의 표준화로 이어졌다.
19세기 중엽, 수트의 근대적 형태가 정립됐고, 영국에서 '수트(suit)' 개념, 즉 재킷, 조끼(vest), 바지(trousers) 구성이 정착했다. 재킷의 실루엣은 어깨와 가슴은 구조적으로 잡혀 있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간 X(엑스)자형 실루엣으로, 남성의 신체를 '직업적, 합리적, 남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시각적 장치로 작용해 신사의 품격과 절제된 권위를 시각화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수트의 현대적 표준화와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1920년대 재킷은 재즈 문화와 함께 허리선을 다소 높게 하고 허리선 아래로 살짝 퍼지는 날씬한 실루엣의 '재즈 수트'가 인기를 끌었다. 20년대 중반 이후 슬림핏에서 날씬해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핏으로 전환됐고, 1930년대 재킷은 어깨가 넓고 허리선이 드러나는 실루엣으로 서 있을 때 균형 잡힌 매끄러운 라인으로 연출됐다. 20세기 초중반 헐리우드 배우 캐리 그란트(Cary Grant)는 당시 클래식 수트 핏으로 감각적인 남성미를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가 연출한 정제된 테일러링과 직선적 라인의 수트는 성공한 멋진 남성의 복장이라는 이상적 이미지를 안겨줬다.

1985년 남성 수트. 1970~1980년대 경제 성장기와 기업 중심 사회 속에서 수트는 권력의 언어로 작용했다. <출처: G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수트는 일상적 직장복이 됐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세상이 확대되고 젊은 층의 문화가 확대되면서 1960년대는 젊은 층의 유행으로 슬림핏(slim fit)의 짧은 재킷 길이, 좁은 라펠의 미니멀한 모즈룩(Mods look)의 수트는 새로운 세대의 세련된 감성을 표현했다. 이는 시대적 모더니즘과 청년문화 속에서 당시 청춘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젊음과 세련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970~1980년대 경제 성장기와 기업 중심 사회 속에서 수트는 권력의 언어로 작용했다. 어깨가 넓어진 파워 숄더(power shoulder)와 허리가 강조된 '파워 수트(power suit)는 성공과 자신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수트는 권위적이지만 세련된 도시 남성의 모습으로 당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했다.
글로벌화와 IT산업의 부상으로 보다 편안한 패션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 정장 문화의 강도는 약화됐다. 패션 브랜드들은 수트를 개성적으로 재해석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젊은 세대의 가는 신체를 돋보이게 하는 실루엣의 크게 유행해 남성의 이상적 체형도 바뀌었다. 샤넬 브랜드의 상징적 인물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2000년대 초반 크리스찬 디올의 남성복 디자이너였던 에디 슬리먼이 도입한 슬림핏 수트를 소화하기 위해 거의 30㎏ 이상 감량했다고 할 만큼 당시 슬림핏의 정장은 획기적인 남성상의 변화를 보여줬다.

2007 디올 옴므 컬렉션. 에디 슬리먼의 남성 수트. <출처: firstview>
2010년대 이후 재킷은 알렉산더 맥퀸, 톰 브라운, 발렌시아가와 루이비통 등 디자이너에 의해 전형적인 비례가 해체되고 조형적 절개와 스트리트 감성이 더해지면서 역사와 변화를 융합해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수트 재킷은 신사의 도덕성, 근대적 권위, 그리고 개성과 정체성의 표현으로 변화되면서 시대를 나타내는 시각적 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