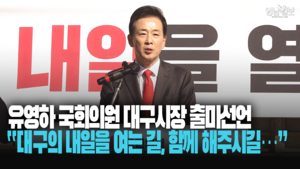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오상균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남구 이천동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헨리를 알 것이다. '캠프 헨리'라는 기지 명칭은 1950년 9월1일 한국전쟁 당시 경북 안동 전선에서 전사한 미2보병사단 38보병연대 소속 프레데릭 F. 헨리 중위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곳 캠프 헨리(Camp Henry) 정문에 들어서면 큰 비석 하나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3·1운동 31주년 기념비다.
1915년 일본제국의회는 조선 주둔 2개 사단 병력 증설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있던 경성(서울) 용산 20사단과 함북 나남 19사단 외에 2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군부대가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조선 각지의 일본인들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그 결과 대전이 아닌 대구에 보병 80연대가 들어오게 됐고, 대전에는 무마 차원에서 1개 대대, 즉 3대대만 배치됐다. 대구 보병 80연대 주둔지는 1916년 대봉정(현재 남구 이천동)에 조성됐다.
1919년 대구에서의 3·1만세운동은 3월8일 큰 장인 서문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학생을 포함한 1천여 명의 시위행렬은 제지하는 일제 경찰을 뚫고 대신동을 거쳐 대구경찰서로 향했다. 시위대는 이곳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 종로로 향했으며, 염매시장을 지나 달성군청 근처(현 대구백화점 본점 터)에 이르렀다. 그때 일본군 보병 80연대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로 일본군 80연대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상징이 됐다. 대구를 군도(軍都), 즉 군인의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932년 4월 80연대는 정문에 '일본천왕 칙유하사 50주년 기념탑'을 건립해 제막했다. 전면에는 '용감한 군인들에게 군기를 맡기고 일본의 국위를 빛내기 위함이다'라는 칙유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일제는 부대와 가까운 대명동 언덕에도 130척(약 39m) 높이의 거대한 충령탑을 건립해 일본군의 영혼을 진혼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거대한 대구 충령탑은 광복 1주년이 되는 1946년 8월15일 대구시민에 의해 폭파됐다. 그 생생한 영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반면 일왕의 칙유가 새겨진 기념탑은 광복 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
광복이 된 후 80연대 자리엔 국군 보병 3여단 6연대가 들어왔다. 연대장이던 육군 중령 오덕준(吳德俊)은 정문 앞에 있는 일왕 칙유하사 기념탑을 보게 된다. 애국심이 투철했던 그는 1949년 3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이 탑을 개조했다. 기념탑 전면 상단에는 '삼일운동 삼십일주년 기념비'라고 새겼다. 기존 일왕 칙유는 지워버리고 대신 국군의 3대 선서(△우리는 선열의 혈적에 따라 죽음으로써 민족 국가를 지키자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며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를 새겨 넣었다.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진 군인이었던 그는 한국전쟁 당시 9사단장, 11사단장을 거쳐 전쟁 후에는 3군단장,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74년이 흘렀다. 3·8 대구만세시위를 진압하던 일본 80연대는 사라졌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미군기지 내 그 자리에는 일왕 칙유의 흔적을 지우고 새겨진 3·1절 삼십일주년 기념비가 지금까지 외롭게 남아 있다.
오상균(광복회 대구시지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