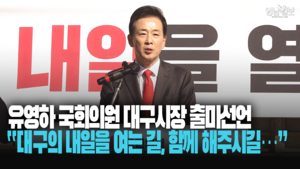개정 앞두고 국회 안팎 전운
정당·의원 간 이해관계 첨예
정개특위 두 선택지 제안해
핵심 쟁점은 거대 양당 합의
분권강화 시대정신 따르길
 |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연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합의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항간에는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한 듯하다. 정당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원들, 다선 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까닭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합의개정이 결국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합의개정이 그 반대보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제도, 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들 스스로 선거제도의 근간에 손을 댄 이례적인 시도였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시도 앞에서 거대 양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보다는 결렬을 선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급조된 비례위성정당들의 출현 및 기존 소수정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2020년 4월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유권자 전체가 거대 양당의 속셈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한 겉으로는 선거법 합의개정을 보이콧하면서 속으로는 슬며시 적대적 공존 구도를 연장하는 노림수가 통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어떻게든 합의개정을 통해 심판을 피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선거법 개정에서 핵심 쟁점은 거대 양당의 합의 또는 거래 내역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았다. 하나는 소선거구 지역구의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의석을 50석 정도 늘리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지역에 관하여 이른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출마 허용 등은 이 둘에 비하면 중요도가 덜하다.
아직 전원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거대 양당의 안팎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진퇴양난으로 몰려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 다수의 여론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다른 쪽에선 중대선거구제의 정치적 득실을 놓고 계산이 치열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른바 다당제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의 입장에선 기득권을 지키면서 타협을 이룰 제도적 묘수가 절실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거대 양당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반드시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쩨쩨하게 중앙의 입법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복무하기만 하면 제3의 대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거대 양당에게 제안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동결한 가운데 중지를 모아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 및 헌법 개정의 로드맵을 함께 합의하면 어떻겠는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의 규모, 권한, 선출방식 등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합의하여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그 부칙에 2026년 6월의 지방선거 시 참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4월의 선거는 새로운 헌법의 민의원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고, 국민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중앙의 입법 권력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