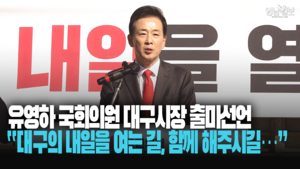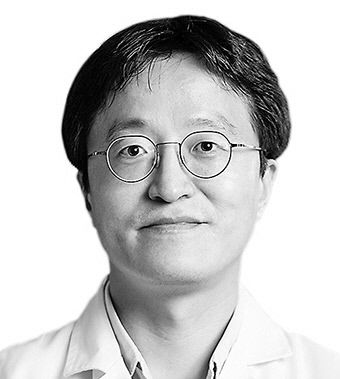 |
|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
필자는 플라스틱의 기본 물질인 '고분자'라는 화학 물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플라스틱의 오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도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오래된 관념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를 반문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에서 두 가지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술적 해결 접근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오래전부터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명제는 분해되는 데 오래 걸리고 무분별한 사용과 폐기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플라스틱은 분해가 어렵다'와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다'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상반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작게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애초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쓰는 소재도 많이 있지만, 자연 특히 해양에 폐기되는 많은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화학적으로 작게 분해되고 유독성 화학물질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수준으로 용출될 수 있다. 분해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이라면, 금속이나 세라믹이 더 견고하고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빛, 충격, 열,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해 비교적 분해가 용이한 물질이기에 우리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종의 첨가제를 넣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언급할 때 플라스틱은 아주 손쉬운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잘 보면 결국 플라스틱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무분별하게 과량으로 더럽게 폐기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플라스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잘 분류해서 폐기한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플라스틱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고, 이를 재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가령 필요가 없어졌을 때 썩어 없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마법 말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요구는 결국 인간이 폐기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느낌이다. 산업화 이후 인간이 영위하는 삶은 결국 고성능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형태로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가공되는 무언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애초부터 상업적 이익에 기반한 기술 발전이었기에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쓰레기와 부산물 처리 그리고 재사용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였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순환적 생산과 생활 방식은 구체적인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지구라는 공동의 환경은 태초부터 지속적으로 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비단 기후뿐 아니라 땅과 바다의 비율, 대기 중 산소의 농도 등 생명현상과 연계되는 많은 요소가 늘 일정하지는 않다. 극적인 변환기에 항상 기존 종의 종말과 새로운 종의 출현이 있었다. 과연 지금 인류세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막연히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