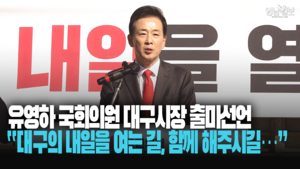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정재걸 (대구교대 명예교수) |
나이가 들어 죽음에 가까워지면 불안이 증가한다. 몸 한 부분이 아프거나 삶의 한구석이 삐걱거리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한다. 불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가올 위험을 인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서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친숙한 세계가 무너지는 섬뜩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면 무조건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불안을 억누르면 불안은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하이데거는 불안과 공포를 구분하여 불안은 죽음에 직면해 있는 나의 낯설고 섬뜩한 존재에 대한 것이고, 공포는 내가 나의 존재와 동일시하며 집착하는 특정한 존재자들이 손상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던져진 존재이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불안은 항상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서 일렁거리고 있다. 죽음이 어느 길모퉁이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되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영구동토층이 녹아 툰드라그리닝이 발생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2배에 달하는 메탄가스가 방출된다는 판도라의 상자도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불안이 줄어들까. 매일매일 시간표에 짜인 대로 진행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면 불안이 사라질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은 우리를 권태라는 또 다른 지옥에 밀어 넣는다. 여행을 떠나면 집이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또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은 이런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어린아이는 같은 놀이를 수없이 반복해도, 매일 똑같은 삶이 계속되어도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반면 노인들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 죽음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루의 시간을 지루하게 느낀다. 하루는 느리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양극성 장애라는 질환이 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국의 정보기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순간에 자신은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환이다. 현대인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과 반복되는 일상적 삶에서 비롯되는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역시 양극성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극성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은 일에 몰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불안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불안은 증폭될 뿐이었다. 하이데거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불안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죽음으로 미리 달려감'처럼 불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면 진정하게 충만한 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울부짖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나는 지금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려 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불안을 마주해야 한다.
권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태는 정해진 일과를 해야만 하는 숙제로 생각할 때 힘을 발한다. 하루의 일과를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만들면 어떨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사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부부관계도 마음먹기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설거지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여기면 손에 느껴지는 따뜻한 물의 감각과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밥그릇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운동을 위한 걷기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여기면 매일 걷는 길이 새롭게 보인다. 이해인 수녀는 '사월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느끼며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라고 묻는 아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매일매일 오늘이기 때문이다. 불안과 권태가 느껴지면 이해인 수녀와 같이 내년 봄은 너무 멀다고 스스로 말해보라.
〈대구교대 명예교수〉

정재걸 대구교대 명예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