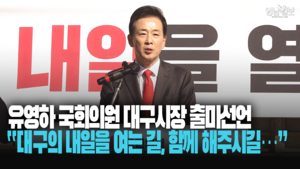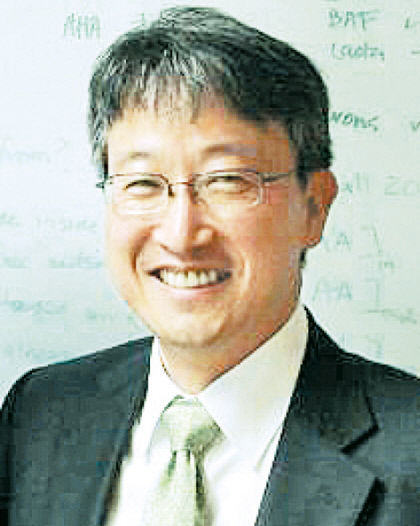 |
| 문제일 (디지스트 뇌과학과 교수) |
올 초부터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TP 열풍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실감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관심으로 다시 돌아오니 7년 전 이세돌 9단이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겨뤘던 세기의 바둑대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패배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막강한 위력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겼던 제4국입니다. 이세돌 9단의 78수로 냉정한 알파고는 갑자기 악수를 연발하면서 무너졌고, 결국 이 한 수는 대국을 결정지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대국을 마치고 복기를 하는 동안 수많은 해석이 오고 갔지만 어떤 논리적인 해설보다 "그 자리가 가장 좋을 것 같았다"는 말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즉 인간이기에 바둑이 가진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논리로만 무장된 알파고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한 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히포크라테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논리를 담당하는 지성의 뇌와 함께 감정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교육받았습니다.
사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은 불안한 심리상태에서는 생각이 비관적으로 흘러가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거나 행복한 상태에서 우리는 평소 상상도 못 할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이성적 사고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시 이세돌 9단이 78수를 놓기 직전 그의 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세돌 9단은 그 순간만큼은 알파고의 다음 수와 그 다음 수를 계산하는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알파고를 이겨보고 싶다는 감정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뇌는 창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Leonard Mlodinow 교수도 감정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정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그의 저서 '감정의 뇌과학'(Emotional: How Feelings Shape Our Thinking)에서 강조한 것도 "무엇보다 감정에 따르시오"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긍정적 감정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하다는 것이 긍정적 감정상태라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연히 분노나 혐오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긍정적 감정상태가 아니겠죠. 부정적 감정상태는 건강상태로도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부정적 감정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폭식이나 거식증과 같은 섭식행동도 긍정적인 감정상태가 아니라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스스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정적 감정상태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유발된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불안감만 잘 다스려도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땀이 나는 유산소운동이나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향기 역시 도움이 됩니다. 실제 향기박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우울감에 빠진 분들이 특정 향기를 맡고 우울감에서 벗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경우를 관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긍정적 감정상태를 불러오는 여러분의 향기를 찾아보길 제언합니다.
오는 8월12일과 13일, 향기박사 연구실은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 향기과학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름 바닷바람의 추억'이란 주제로 여름 바닷가에서 경험한 행복했던 기억을 불러내는 자기만의 향기를 만드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말, 하루 시간을 내어 시원한 과학관에서 행복했던 여름 바닷가 휴가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찾아주는 자기만의 향기를 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지스트 뇌과학과 교수

문제일 디지스트 뇌과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