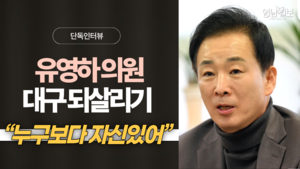동포에게 총 겨누던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나라 지키고
부일하고 친일했던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경제 일으켜
대한민국의 '본질적' 모순
 |
| 변종현 편집국 부국장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데모 진압에 차출된 이들이 있다. 1987년 6월 초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절정을 향해 치달을 즈음이다. 거리마다 전투 같은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진압도 무자비해져 갔다. 스물둘의 이한열이 최루탄에 스러지고, 전투경찰(전경) 1개 중대는 시민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화 투쟁이 실제 길거리에선 생존게임이 되었다. 소위 '닭장차'로 불리던 전경버스 안에서 대기 중이던 전경들의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총구는 어디로 향해야 하지."
이한열 또래의 한 대원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닭장 안에 흐르던 긴 침묵을 깬 것은 또 다른 대원의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하늘."
저 너머 친구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주어졌고, 또 누군가에게는 최루탄과 경찰봉이 주어졌다. 잔인한 시대였다. 동시대를 살아가던 20대 간의 비극,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해 왔다.
대구사람 장언조는 일제에 강제 징집됐지만 광복군에 합류하기 위해 탈출했다. 그의 나이 스물둘일 때 일이다. 스물한 살이던 경북 의성사람 장성표는 일본군을 탈출해 중국군 제9전구(戰區) 유격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쳤다. 스물하나의 경북 고령사람 신길우 역시 일본군을 탈출했다. 그는 중국군 유격대에 몸담았다가 이후 광복군에서 복무했다. 경북 성주사람 강명호도 스물한 살이던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한 뒤 광복군에 입대했다. 경북 고령사람 박영진은 나이 스물에 한국청년간부훈련반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3년 후인 1943년 연합군 일원으로 인도에 파견됐다. 이들은 지금 모두 국립신암선열공원(대구)에 잠들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항일 조직을 토벌할 목적으로 1938년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많은 20대 조선인이 자원입대했다. 그들의 총구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또래 조선인에게로 향해 있었다. 일제의 뜻을 받든 이들 중에는 국군 창군(創軍) 원로로 추앙받으며 국립현충원에 묻힌 이들도 있다. 훗날 6·25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백선엽은 그의 나이 스물둘 때 간도특설대 장교로 있었다. 간도특설대의 '부대가(部隊歌)'를 아는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모순은 아이러니하게도 광복을 맞이하면서 배태됐다. 일제강점기 동포에게 총구를 겨누던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부일·친일했던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경제를 부흥시켰다. 전후 그들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주류사회에 빠르게 진입해 기득권층이 되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세탁이 필요했고 정당성 확보도 필요했다. 그것은 교묘하게 진영 프레임으로 고도화하고, 궁극에는 하나의 현상으로 국민 각자에게 내재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양 진영의 콘크리트층을 보라.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보수 대 진보'에서 '정의 대 불의'로의 전환은 요원한가. 빛 다시 보고 흙 다시 만져 본 그날로부터 78년이 흐른 날의 단상이다.
이한열 또래의 한 대원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닭장 안에 흐르던 긴 침묵을 깬 것은 또 다른 대원의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하늘."
저 너머 친구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주어졌고, 또 누군가에게는 최루탄과 경찰봉이 주어졌다. 잔인한 시대였다. 동시대를 살아가던 20대 간의 비극,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해 왔다.
대구사람 장언조는 일제에 강제 징집됐지만 광복군에 합류하기 위해 탈출했다. 그의 나이 스물둘일 때 일이다. 스물한 살이던 경북 의성사람 장성표는 일본군을 탈출해 중국군 제9전구(戰區) 유격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쳤다. 스물하나의 경북 고령사람 신길우 역시 일본군을 탈출했다. 그는 중국군 유격대에 몸담았다가 이후 광복군에서 복무했다. 경북 성주사람 강명호도 스물한 살이던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한 뒤 광복군에 입대했다. 경북 고령사람 박영진은 나이 스물에 한국청년간부훈련반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3년 후인 1943년 연합군 일원으로 인도에 파견됐다. 이들은 지금 모두 국립신암선열공원(대구)에 잠들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항일 조직을 토벌할 목적으로 1938년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많은 20대 조선인이 자원입대했다. 그들의 총구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또래 조선인에게로 향해 있었다. 일제의 뜻을 받든 이들 중에는 국군 창군(創軍) 원로로 추앙받으며 국립현충원에 묻힌 이들도 있다. 훗날 6·25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백선엽은 그의 나이 스물둘 때 간도특설대 장교로 있었다. 간도특설대의 '부대가(部隊歌)'를 아는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모순은 아이러니하게도 광복을 맞이하면서 배태됐다. 일제강점기 동포에게 총구를 겨누던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부일·친일했던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경제를 부흥시켰다. 전후 그들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주류사회에 빠르게 진입해 기득권층이 되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세탁이 필요했고 정당성 확보도 필요했다. 그것은 교묘하게 진영 프레임으로 고도화하고, 궁극에는 하나의 현상으로 국민 각자에게 내재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양 진영의 콘크리트층을 보라.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보수 대 진보'에서 '정의 대 불의'로의 전환은 요원한가. 빛 다시 보고 흙 다시 만져 본 그날로부터 78년이 흐른 날의 단상이다.
변종현 편집국 부국장

변종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