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피·펑크·힙합 젊은층 서브컬처
패션으로 사회·정치적 저항 표현
1980년대 이후 디자이너 브랜드들
T셔츠에 슬로건·이슈 직접 프린팅
메시지 공유 훌륭한 도구로 활용돼
![[한희정의 소소한 패션 히스토리] 패션에 메시지를 입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202412/2024121301000323700014641.jpg) |
페미니스트의 메시지를 담은 디올 브랜드의 티셔츠. (Teen vogue 제공)
사람들은 매일 입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개성을 나타낸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 옷을 선택할 때 어떤 스타일로 입을 것인지, 어떤 색상 또는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지 고려한다. 이렇듯 패션은 착장자의 멋과 개성, 그리고 둘러싼 환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훌륭한 표지판으로도 활용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 주장 등에 대해 주로 말과 글로 나타내지만 그 표현의 과정과 방법에는 시공간적 제한이 있다. 반면 패션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착장자의 의지가 있으면 확장 범위가 넓다. 패션을 통한 메시지 전달에서는 저항의 의미를 담은 경우가 많다. 현대 패션에서 살펴보면 1960~70년대 저항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거부, 평화와 사랑의 표현인 히피패션, 1970년대 후반 반문화적·반체제적인 메시지를 담은 펑크 패션, 1970~80년대 흑인 사회의 정체성과 저항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된 힙합 패션을 그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한희정의 소소한 패션 히스토리] 패션에 메시지를 입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202412/2024121301000323700014642.jpg) |
| 이민자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프라발 구룽의 컬렉션. <Hapers bazzar 제공> |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언어적 글로 직접 표현한 패션의 사례는 주로 사회적 큰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1984년 영국 총리 마가릿 대처가 주최한 런던 패션 위크 디자이너들을 위한 리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은 핵미사일 항의 메시지인 '58% don't want Pershing(58%가 퍼싱미사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크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어 핵무기 반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한 핵탄도 미사일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 배치하는 것을 수용한 마가릿 대처 총리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캐서린 햄넷은 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적용해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
2017년 디올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We Should All Be Feminists(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선보이며 페미니즘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확장됐던 1970년대 소설가 아디치(Adichie)의 에세이 제목으로 여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탐구가 담겨 있다. 디올 브랜드는 패션을 통해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지지하면서 그 판매 수익 중 일부도 여성의 교육 등 가치있는 일에 지원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패션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Black Lives Matter(BLM;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제작해 메시지를 지원했다. 이 시위는 2012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대 소년에게 총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에 대해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경찰관에게 총격당해 사망한 사건 이후 더욱 확산된 것이었다.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잔인한 폭력에 불복종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때론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여러 패션브랜드에서 디자인 영감으로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사회적 메시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했다.
![[한희정의 소소한 패션 히스토리] 패션에 메시지를 입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202412/2024121301000323700014643.jpg) |
| 한희정 계명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
패션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에 녹인 사회·정치적 메시지는 디자인적 표현이나 마케팅 전략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디자이너와 착장자가 주장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나타내고 전달하고 전파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희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명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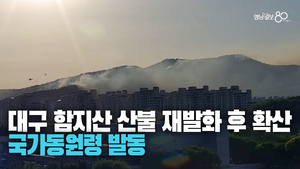
![[영상 스케치]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4/news-a.v1.20250428.c948f38aa38440a4bde056cf70a1892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