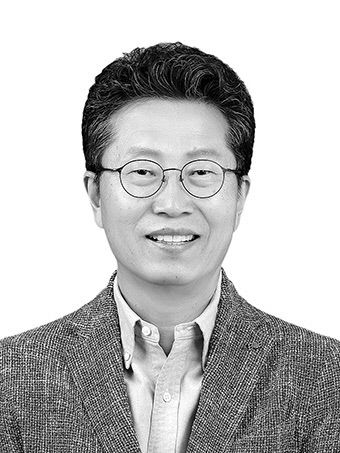 |
|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
오늘날 흔히 국가도 경영하는 시대라고 한다. 한국은 IMF 기준(2024) 경제규모(GDP)로 보면 세계 14위의 초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광복 8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주>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6월3일 치러질 대선에서 <주>대한민국의 차기 최고경영자(대통령) 선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먼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자. 1996년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기고한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기업은 개방형 시스템이지만 국가 경제는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 경영은 다른 부문의 희생을 생각할 필요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반면, 국가 경영은 한 부문이 잘되면 다른 부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기업보다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할 뿐아니라 다루어야할 문제도 다르다. 하지만 기업이든 국가든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면, 국가 최고경영자로서 가져야 할 역량 및 자질은 무엇일까?
첫째, 지도자는 시대적 과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과정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역량'이다. 구체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 수립 역량과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정책 추진 역량,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관리 능력과 인사 능력,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 안보 능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정치의 핵심은 '소통과 협치'이다. 특히,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설득과 양보를 통해 통합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직접 선출한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되었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 3명이고, 자녀와 측근의 범죄 탓에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국가 경영 최고책임자로서의 <주>대한민국 CEO를 잘 뽑는 것은 결국 주주(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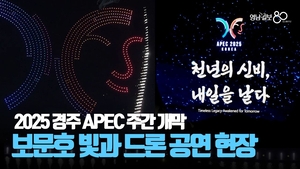
![[TK큐] 장애인 이동권 경계를 허물다, 스웨덴 휠체어 장애인의 하루](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a.v1.20251022.a812a87a6ed44e22bf947c163bec3955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