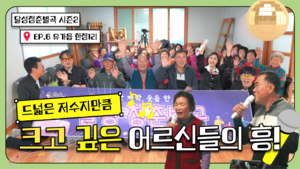수도권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권 모두 균형 개발을 부르짖었건만, 외려 그 성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 탐욕의 도시 바빌론 같은 무한증식을 거듭하는 괴물체가 됐다. 지방에 몇 남지 않은 대기업마저 인재를 찾아 수도권에 새 둥지를 트는 상황이다. 수도권 공화국이 만든 '악의 고리'인 셈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경기도 성남 위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에 착수했다. 글로벌센터는 이 그룹의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격이다. 포항 본원의 20배 규모 분원을 세우려는 야심 찬 계획이 지역민 반발에 부딪히자, 이름만 살짝 바꾼 셈이다. 지역민을 기만(欺瞞)한 격이지만, 포스코의 고심도 묻어난다. AI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선 수도권에 연구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다. 울산의 HD현대는 포스코보다 한발 먼저 연구기능을 수도권으로 옮겼다. 지방 대기업도 핵심 연구개발(R&D) 조직은 수도권에 두는 게 추세다. 인재 남방 한계선이 경기도 성남, 화성 기점으로 형성돼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국가적으론 이공계 인재의 '탈(脫) 한국'을 걱정한다. 이는 처우개선으로 일정 부문 해결할 수 있다. 이보다 지방의 기업과 청년 유출은 고차 방정식보다 더 난해한 문제다. 작금의 수도권 블랙홀은 더는 '일자리'가 '살 곳'을 결정하지 않는 젊은 층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연봉만큼 정주 여건을 중시한다. 근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방 근무는 꺼린다. 좋은 일자리만으로 젊은 층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몬다. 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같은 '공급 중심'의 균형 개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 활로를 사람과 교육에서 찾는 게 유효해 보인다.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이른바 '인재 균형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인재 양성이 지방 소멸 위기라는 '밑 빠진 독'을 메우는 묘책이 될 수 있다.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교육, 정주 여건을 먼저 만들면 기업 또한 지방으로 유턴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려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균형 정책의 무게 중심을 공간 재배치에서 사람, 교육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창하는 서울대 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지역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거점대학 교육역량을 서울대 수준까지 근접하기는 어렵지 않다. 파격적인 장학금과 산업 연계, 취업 보장이라는 '당근'은 '탈 지방' 현상을 완화하는 모멘텀이 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규제 혁신)'도 같은 맥락이다. 광역 단위에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R&D에 집중 투자를 하면, 인재 역시 지역에 머무르게 된다는 방법론이 설득력 있다.
정권마다 내놓는 선거용 선심 정책에만 매달린다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소멸 시계를 멈추려면 파격적인 발상, 과감한 실행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권 중심으로 지자체와 거점대학이 손을 잡고, 특화산업에 맞춘 인재 육성과 기업 친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때 지역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인재를 찾아 지방 대기업도
수도권에 새 둥지 트고 있어
공간 재배치 균형전략 한계
인재와 교육 중심 정책 전환
메가 샌드박스도 좋은 방안

윤철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