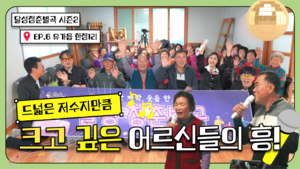치매 환자가 국내에서도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 탓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이라는 탄식마저 나온다. 이런 와중에 한 가닥 위안이 되는 사실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신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당분간 국내 환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신약을 바로 접할 수 없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신약이 '키썬라'이다.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에선 승인이 난 반면, 국내에선 3년 뒤에야 이 약을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11월 어렵사리 국내 시판에 들어간 신약 '레켐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 환자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 약값만 연간 3천만~5천만 원이 든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내놓을 때 '한국 패싱'도 흔하다. 한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 낮은 약값 탓을 핑계로 댄다.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약의 값이 대체로 비싸,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규제 원성이 높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돈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유연한 행정을 기대한다. 더는 환자 경제력이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와선 안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