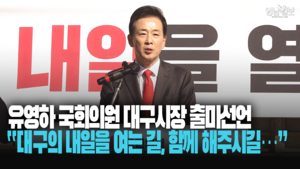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뉜다. 자연법은 도덕적 법원리이고 실정법은 시행되는 구체적 법이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상위 규범이며 정의, 이성, 양심이 그 근간이다. 자연법 사상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반이 됐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 원리로 자연법을 인정해 왔다. 물론 형벌의 정도나 계약의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해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진다. 자연법 사상을 체계화한 로마의 법률가이자 스토아학파 철학자 키케로는 "자연법은 초법적 규약"이라고 설파했다. "최상의 자연법은 우리 마음속의 양심"이라고도 했다.
키케로의 사유(思惟)에 따른다면 상식이야말로 최상의 자연법이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포기의 후폭풍이 거세다. 왜일까. 상식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기실 법은 상식이다. "법의 정신이나 어떤 구체적인 법의 본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질서이거나 혹은 그 시대, 그 사회에 고유한 합의이기에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정혜진 변호사).
하지만 실정법은 삼라만상의 모든 사회 현상과 사건의 규범을 적시하지 못한다. 법은 유한한데 현상과 사건은 무한해서다. 그래서 사법체계에 따라 적절히 규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이 상식이라면 법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규율과 절차도 상식적이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유동규 측에 주기로 약속한 428억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면소했다.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아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낮아졌고, 이해충돌 무죄 판단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수익 7천814억원 추징을 다퉈볼 기회를 상실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더 난삽해졌다.
대장동 사건처럼 의혹이 심대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 많은 판결은 섣불리 봉합해선 곤란하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항소포기로 봉인하겠다?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노린 무리수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애매모호한 배임죄의 경우 차라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검찰 내부의 유난한 반발도 의뭉스럽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지 판사, 심 전 총장 다 법적 상식을 심히 거슬렀다. 검찰 구성원들이 그땐 왜 침묵했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는 왜 모른 척했나. 반발과 항명도 선택적으로 하겠다? 1년 후면 문 닫아야 할 검찰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하긴 선택적 기소와 자의적 수사는 정치검찰의 루틴이긴 했다.
대법원이 문화재 주변의 건설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문화유적지의 조망을 가로막는 142m 건물 건립이 타당하다고? 상식은 자연법이라는데 실정법은 때론 이렇듯 상식을 형해화한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도덕법칙을 마음속에 품은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비상식적이고 생경한 장면들을 보면 칸트의 인식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논설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상식 배치
범죄수익 다퉈볼 기회 상실
'불이익 변경 금지' 노렸나
검찰, 尹 구속취소 땐 침묵
선택적 반발 의뭉스러워

박규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