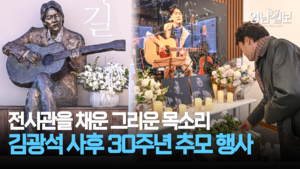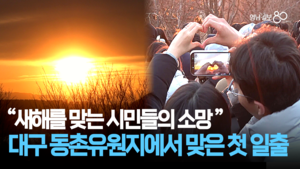수백년 간 마을 수호신 역할…청송의 ‘살아있는 역사’
홍원1리 입구에 서 있는 개오동나무
1570년쯤 심어진 관리 왕버들나무
마을 신앙 계승과 공동체의 구심점
신기리 느티나무 아래선 동제 이어가
천연기념물이란 말을 '천연+기념물'로 나눠보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천연'이란 말은 나무·새·동굴 같은 자연을, '기념'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둠을 뜻한다. 사람은 먹고 자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그 자연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변형시키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은 사람과 자연이 만나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며, 사람이 자연 앞에서 겸손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송군의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은 모두 4점이다. 안덕면 장전리 향나무, 부남면 홍원리 개오동나무, 파천면 관리 왕버들, 파천면 신기리 느티나무 등 모두 수백년 된 나무들이다.
장전리 향나무는 선조의 묘소 아래 심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 어귀에 심어져 당산나무 역할을 해왔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현재 홍원리, 관리에서는 동제가 없어졌고 신기리에서만 매년 정월 대보름에 동제가 열리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우도 2건이 있다. 청송읍 금곡리 향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나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재정비해 새로 지정할 당시, 이미 보존가치를 잃어 지정과 동시에 해제됐다. 1982년에 지정된 청송읍 부곡리 왕버들은 2002년 태풍 '루사'로 하천 제방에 서 있던 나무의 뿌리가 끊겨 300m 가량 떠내려가 그해 11월 지정 해제됐다.

1580년 심어진 청송 안덕면 장전리 향나무는 운강 남계조 묘소 아래 있다. '서있다'고 하기보다는 '누워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키보다 옆으로 뻗은 수관의 폭이 더 길다.
◆청송 안덕면 장전리 향나무
청송 인덕면 장전리 향나무는 영양 남씨 청송 입향조 운강 남계조(1541~1621)의 묘소 아래에 서 있다. 1580년에 심어진 이 나무는 서 있다고 해야 할지 누워있다고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모습이다. 높이가 7.5m인데 가지들이 옆으로 넓게 뻗어 수관 폭이 25m에 이른다. 나무가 터 잡은 야트막한 언덕을 뚜껑처럼 덮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안내판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눈향나무 같은 나무 모양"이라고 써놓았다. 이 나무가 땅을 기면서 자라는 종인 '눈(누운)향나무'는 아니지만 모습은 비슷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향나무 옆에는 운강공 묘도비각과 독립유공 13의사 서훈기념비가 서 있고, 반대쪽에는 운강공 묘를 지키기 위해 1629년 건립된 재사 화지재(花池齋)가 있다.
운강 남계조의 선대는 영양에서 살고 있었으나,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어머니와 식솔을 데리고 청송으로 이주했다. 형 남윤조는 곽재우 의진에 참여해 창녕 화왕산에서 전사했다. 형제가 나라의 일과 집안의 일을 나눠 맡았을 뿐, 뜻이야 다를 리가 있었겠는가.
남윤조 남계조 형제의 뜻은 면면히 이어지다 200년이 지난 뒤 항일의병으로 다시 떨쳐 일어났다. 서훈기념비에 따르면 영양 남씨 운강공파 한 집안에서 청송의진과 산남의진에 참여해 의병투쟁을 벌인 애국지사는 모두 24명이다. 대한민국 건국공로 독립유공 의병선열로 서훈된 지사는 독립장 남석인, 애국장 남승하 남석술 남경숙 등 13명이고, 적원일기와 산남창의지 등을 통해 고증은 됐으나 후손이 없어 서훈되지 못한 지사는 안구석, 안기철 등 11명이다.
햇볕을 찾아 옆으로 뻗어나간 향나무 가지들이 어느 때인가 바닥에 몸을 내려놓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더는 옆으로 뻗을 필요가 없었던지 꼿꼿하게 위로 자라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 향나무의 품 안에서 젊은 향나무 두 그루가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위로 자라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나니 천연기념물 향나무가 한 집안의 역사를 얘기해주는 것 같다.

청송 홍원리의 개오동나무는 개오동나무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1690년쯤 심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개오동나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 나무 아래에서 동제를 지내곤 했다.
◆청송 부남면 홍원리 개오동나무
청송 부남면 홍원리 개오동나무는 개오동나무 중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모두 세 그루가 홍원1리 마을입구 도로변에 서 있는데, 1690년 쯤 심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개오동나무라고 한다.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는 잎 모양이 넓어 비슷하게 보이지만 오동은 현삼과, 개오동은 능소화과로 분류학상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다. 오동나무는 원산지가 한국이고 개오동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이며, 목질이나 열매 모양도 다르다. 개오동나무는 열매가 노끈 같이 길쭉한 모양으로 주렁주렁 달려 노나무, 노끈나무라고도 한다. 늦가을 개오동나무 아래엔 마른 잎들이 쌓여 발아래에서 바스락 바스락 부서지고, 고개를 들면 누런 열매들이 바람에 몸을 부비며 사락사락 소리를 낸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동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1998년 천연기념물 지정이 될 때쯤부터 외부 지원이 끊겨 동제를 지내지 않게 됐다고 한다. 마을 수호신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옛 생각을 떠올릴 때면 이 개오동나무와 그 아래 넓고 짙은 그늘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1570년쯤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송 파천면 관리 왕버들. 조선시대 젊은 남녀의 전설이 전해진다. 또 동제에 쓰인 종이로 글씨 연습을 하면 글씨를 잘 쓰게 된다는 이야기도 남아있다.
◆청송 파천면 관리 왕버들
청송 관리 왕버들은 1570년쯤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8m 가슴 높이 줄기둘레 5.7m의 크고 잘 생긴 나무다.
이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이웃 처녀와 혼인하기 위해 처녀의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나는데, 기다려도 청년이 돌아오지 않자 처녀는 이 왕버들에 목을 맸다. 그 후 왕버들 곁에 소나무가 자라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죽은 처녀의 넋이라 해 이 두 나무를 약속의 상징으로 여겼다.
마을사람들은 두 나무는 당산목으로 삼아 음력 정월 14일 밤에 동제를 지냈으며, 그때 쓰인 종이로 글씨 연습을 하면 글씨를 잘 쓰게 된다는 말이 있어 동제가 끝나면 종이를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관리의 동제는 현재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왕버들 옆의 소나무도 2006년께 고사했으며 지금은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만세송(萬歲松)이라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청송 파천면 신기리 느티나무에는 여러 겹의 빛바랜 새끼줄이 둘러져 있는데, 여전히 동제를 지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1660년쯤 인동 장씨 입향조가 심었다고 하는 이 나무에 위아래 가지에서 동시에 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청송 파천면 신기리 느티나무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에는 빛바랜 왼새끼 금줄이 여러 겹 둘러져 있다. 여전히 동제를 지내고 있다는 뜻이다. 1660년쯤 인동 장씨 입향조가 심었다고 하는 이 나무에는 위아래 가지에서 동시에 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당산나무로 가장 흔한 것이 느티나무인데,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정자나무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동제는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다. 복을 비는 민간신앙의 성격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축제이기도 했다. 신기1리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동제를 지낸다.
요즘은 동제를 주관할 제관 두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제관이 되면 동제 석 달 전부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근신에 들어간다.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해도 문상을 가지 못한다. 정월 초하루 즈음에는 왼새끼를 꼬아 당산나무 아래위로 금줄을 두르고, 당산나무에서 제관 집까지 가는 길 양쪽에 2m 간격으로 황토를 한 줌씩 뿌려놓아 나쁜 기운을 막는다. 동제 전날 밤에 부부가 동침하면 부정 탈 수 있으므로 제관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대보름 밤에 당제를 지내고 나면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지난 1년 간의 마을 결산보고를 포함해 대동회를 연다. 신기리 동제가 지금까지 옛 방식 그대로 이어진 것은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등 외부의 도움과 함께, 주민들의 마을사랑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며, 하늘을 우러르며 농사를 지었던 선조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이 느티나무는 수정사, 객주문학관, 진보시장을 거쳐 고현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외씨버선길 제3구간 김주영객주길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글=김광재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공동기획 - 청송군>

박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