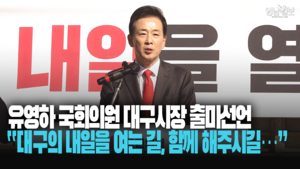|
| 이선민 (트래덜반 대표·안무가) |
필자는 지난 주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2024 Dancer's Job concert' 공연에서 두 개 작품의 음성해설을 맡으며 무용 음성 해설가로 데뷔했다.
음성해설 대본을 준비하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말로 형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아니,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사회적 피로도를 생각하면 어렵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행하던 것들에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 질문에 대한 반경을 확장해 무대 위의 플레이어로서뿐만 아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방향에서도 실행할 방법을 찾다가 무용 음성해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용음성해설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음성해설가 수업 중 인식개선교육이 있던 날이었다. 함께 수강하는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시각을 청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공연 향유에 도움이 될까요?"
돌아오는 답변에 마음이 먹먹했다. "장애인은 무용이 내 취향인지 아닌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타 관객의 탄성 소리, 박수 소리, 감정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내 취향을 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말 문화예술 관람 비중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미치는 비율로 문화 예술을 누리고 있었다. 100명 중 7명꼴인 셈이다.
공연계에서는 2010년 후반부터 극장과 공연에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며 이런 시도를 하는 공연을 흔히 '접근성 공연'이라고 부른다.
현재 문화 예술계에서는 다른 감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대한 움직임 동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사회는 접근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맞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 당연한 사회를 도모하는 시스템이 이 사회에 고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한다는 것. 앞으로 춤을 추며 풀어나갈 숙제이자 나의 업(業)이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이로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예술이라는 것이 선하고 멋진 역할을 할 때, 진정 예술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이선민<트래덜반 대표·안무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